뉴스
3세대 EGFR-TKI 제제, 가능성과 한계 ‘공존’
1차 치료 확대 및 병용 연구 한창…2차 이후 차선책은 부재
전세미 기자 │ jeonsm@yakup.com


입력 2018-11-26 06:32 수정 2018.11.26 0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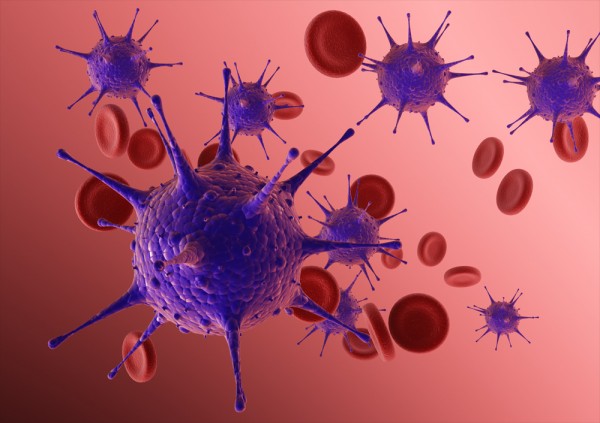
|
현재 3세대 EGFR-TKI 제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오시머티닙(상품명: 타그리소)이 있다. 3세대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만큼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는 우수할 수 있지만, 일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앞으로 남은 입지 확장 가능성들을 보면, 오시머티닙은 현재 국내에는 2차 치료제로 허가가 돼 있다.
하지만 해외 일부 국가 중에는 FLAURA 임상 연구를 근거로 오시머티닙을 1차 치료제로 허가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에서도 적응증을 추가로 확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FLAURA 임상 연구에 따르면, 오시머티닙은 EGFR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18.9개월이었다. 대조군 대비 8.7개월 늘린 수치다.
그렇다면 EGFR-TKI 제제중에서도 3세대가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3세대 EGFR-TKI 제제는 T790M을 표적한다. 이 T790M을 제외한 MET, HER2, PI3K 변이 등은 1세대 또는 2세대 EGFR-TKI 제제에서 이미 내성 기전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가장 최신의 효과적인 약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3세대 EGFR-TKI 제제는 이전 세대에 비해 뇌척수액에 대한 침투력이 더 크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3세대 EGFR-TKI의 진화는 아직 끝이 아니다. 병용 요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몇 연구들을 통해 테포티닙(tepotinib) 또는 카프마티닙(capmatinib)과 EGFR-TKI를 포함한 MET 억제제와의 병용 치료 또한 효과 증폭에 가능성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오시머티닙을 2차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 일부 한계는 있다.
오시머티닙은 내성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T790M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환자들에 대한 주요 저항 기전을 정복하기 위해 고안된 치료제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EGFR-TKI 제제 중에서도 T790M과 같은 주요 기전을 띄는 치료제는 없다는 점에서, 오시머티닙에 내성이 생기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적항암제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EGFR-TKI 내성 EGFR 돌연변이 양성 환자에 대한 치료 기준은 ‘복합 화학 요법’이다. 오시머티닙에 내성이 생긴다면 기존의 화학 요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오시머티닙 치료 후 뇌 내성이 발생한다면, 이후의 표준 치료 또한 ‘방사선 요법’이다. 아직 표준 치료를 넘을 만한 획기적인 차선책은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오시머티닙 2차 치료 이후 내성이 발생한 공식적인 케이스는 없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 내성이 발생하는 표적치료제의 특성상 언제 어떻게 내성이 발현될 지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다.
비소세포폐암의 새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한 3세대 EGFR-TKI 제제가 앞으로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얼마나 확장해 나갈지, 또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한국바이오협회, JPM 2026서 글로벌 투자자 ... -
02 일동제약 케어리브, ‘2026 대한민국 퍼스트... -
03 현대바이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바스켓 2... -
04 에스티큐브, 전이성 대장암 임상 1b/2상 환... -
05 앱클론, "전환우선주 전량 보통주 전환, 오... -
06 삼성에피스홀딩스,'1호' 신약 IND 승인 완료... -
07 샤페론, 차세대 면역항암제 ‘파필릭시맙’ 핵... -
08 CJ바이오사이언스, 메디람한방병원에 장내 ... -
09 슈파스, 코아스템켐온과 디지털병리 기반 AI... -
10 차바이오텍, LG CNS와 자본 참여 포함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