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ASCO서 발표된 눈길 가는 ‘폐암’ 관련 데이터들은?
변이 유전자 영향·새 병용 시도·바이오마커 발굴 등 주목
전세미 기자 │ jeonsm@yakup.com


입력 2019-06-07 06:00 수정 2019.06.07 0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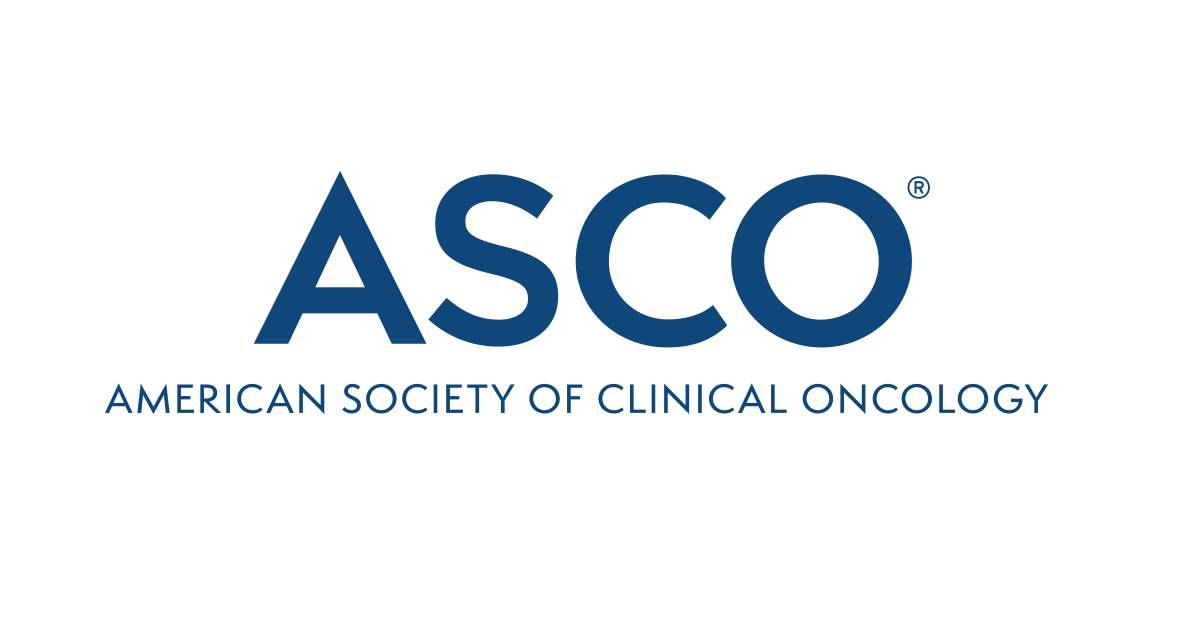
|
ROS1 재배열 폐암에서는 ‘TP53’이 크리조티닙의 효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치료 패러다임에 있어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임과 동시에 EGFR 변이 폐암 정복을 위해 ‘오시머티닙’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 새 바이오마커로 가능성을 보인 ‘TMB’까지 눈길을 끌만한 소식들은 충분했다.
‘TP53’ 변이, ROS1 재배열 폐암서 크리조티닙 효능 반감
ROS1 재배열 폐암(ROS1-rearranged lung cancer)과 관련해서는 ‘TP53’ 유전자 변이가 크리조티닙(상품명: 잴코리)의 효능을 방해해 정상 TP53 유전자(wild-type)에 비해 전체 생존기간(OS), 무진행 생존기간(PFS) 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OS1 재배열 폐암에서 크리조티닙의 활성을 평가하는 최초의 유럽 임상 시험인 EUCROSS 연구에 따르면, 크리조티닙(1일 2회 250mg) 투여군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70%, 질병 통제율(DCR)은 90%,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mPFS)은 19.4개월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TP53 변이 존재 유무로 분류해 분석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PFS가 24개월에 도달할 확률을 보면 TP53 정상형이 속한 환자들은 61%였지만, TP53 변이를 안고 있는 환자들은 0%로 나타났다. OS가 24개월에 도달한 확률 역시 TP53 정상형은 83%인데 비해 TP53 변이는 40%에 불과해 TP53 돌연변이 환자에서 유의하게 짧았다.
심지어 동시 발생 유전학적 이상이 발견된 61%의 환자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돌연변이가 TP53 변이로 지목돼(28%) 크리조티닙 치료에서 TP53 변이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이를 뒷받침 할 근거는 또 있다. 2016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을 통해 ROS1 융합 유전자를 가진 94명의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흔한 돌연변이 유전자는 전체 환자의 33%에서 검출된 TP53이었다.
EGFR 변이 폐암서 병용 시도 중심에 선 ‘오시머티닙’
EGFR 돌연변이 표적 폐암 치료와 관련해서는 오시머티닙(상품명: 타그리소)을 중심으로 새로운 병용 시도를 시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 기대감을 높였다.
먼저 EGFR-TKI 제제인 오시머티닙과 항 VEGF 단클론 항체인 라무시루맙(상품명: 사이람자)을 병용해 유효성을 평가하는 2상 임상인 TORG1833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는 이전에 치료되지 않은 EGFR 돌연변이 양성인 진행성 비편평상피암 환자들을 매일 라무시루맙(10mg/kg) 또는 오시머티닙(80mg/kg)을 일정 기간 복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 등록은 2018년 11월에 시작됐으며 향후 3.5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오시머티닙의 독성 프로파일을 다른 표적 약물과의 조합에서 백본(backbone)으로 활용해 새 이점을 노리는 임상 2상인 SAVANNAH 연구도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이다.
MET 억제제인 사볼리티닙과 오시머티닙의 조합은 이미 예견돼왔다. 그간 FLAURA 및 AURA3 연구 등에서 나타난 세포 유리 DNA(circulating cell-free DNA, ctDNA) 데이터에서 오시머티닙에 대한 내성의 기본적인 기전으로 MET 증폭이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사볼리티닙은 과거 임상 Ib상인 TATTON 연구에서 오시머티닙과 병용했을 때 유의한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인 바 있다.
시험 대상자인 EGFR 돌연변이와 MET 양성인 폐암 환자들은 오시머티닙을 포함한 선행 치료를 1~3회 받은 후, 사볼리티닙(300 또는 600mg/일) 또는 오시머티닙(80mg/kg)을 투여 받는다.
차세대 폐암 바이오마커로 ‘TMB’ 가능성 확인
차세대 폐암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학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DDR(DNA damage response and repair) 유전자 돌연변이와 면역 바이오마커(TMB 및 PD-L1)의 연관성을 평가한 결과가 발표됐다.
비교적 고무적인 부분은 DDR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폐암 환자들은 대부분 높은 TMB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팀은 우리는 DD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5667개의 NSCLC 종양 분자 프로파일을 면역조직화학염색(immunohistochemistry)을 통해 TMB 및 PD-L1의 시퀀싱을 진행했다.
그 결과, 5667개의 샘플 중 54%는 TMB 중간값이 14인 높은 TMB(≥10변이/Mb)를 가졌다. 나머지 46%는 TMB 중간값이 7인 낮은 TMB를 가졌다. PD-L1 발현은 33%에서 높았고(≥50%), 26%에서 중간 수준으로 발현됐으며(1-49%), 41%에서 음성이었다(<1%).
모든 DDR 돌연변이 환자 중 높은 PD-L1 및 높은 TMB를 보유한 환자의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그러나 35%가 높은 TMB를 보유했고, 15%가 높은 PD-L1만을 보유해 차세대 폐암 바이오마커로 TMB의 역할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릴 전망이다.
높은 TMB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로는 ATM, ATR, BARD1, BRCA1, BRCA2, ERCC2, ERCC3, FANCA, MSH2, PALB2 및 POLE이 언급됐으며, 이 중 BRCA1과 PALB2, POLE에서 가장 강한 연관성이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케어젠,필러 의료기기 인도 CDSCO 등록 완료 -
02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케이캡' 결정형 분... -
03 동방에프티엘, ‘니르마트렐비르’ WHO PQ- WH... -
04 OATC, 화장품 향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사 항... -
05 한미약품,당뇨약 멕시코 공급 계약...중남미... -
06 유한양행, 휴이노와 '메모큐' 판매 계약 MOU... -
07 콜마비앤에이치, 서초구청·기빙플러스와 장... -
08 다원메닥스,2026년 코스닥 상장 재도전...중... -
09 아이센스, 영국 연속혈당측정기 시장 진출 -
10 동성제약,나원균 사내이사 '유지'- 이양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