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전자치료제는 어떻게 미래 의학의 중심이 됐나
운반체 ‘벡터’ 통해 결손 단백질 생성…단일 유전질환서 각광
전세미 기자 │ jeonsm@yakup.com


입력 2019-11-06 06:00 수정 2019.11.06 0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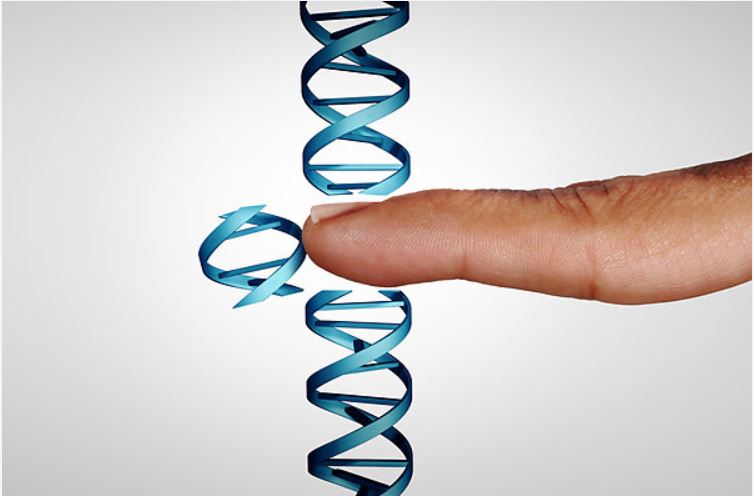
|
유전자치료는 단일 투여를 통해 문제의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인체 내에서 스스로 교정돼 평생 지속되는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설령 질병을 일으킨 유전자가 그대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질환의 증상/징후가 개선될 수도 있다.
유전자 편집(gene editing), 후생유전학(epigenetics) 등 유전자 이용 치료법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벡터(vector)’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gene therapy)다.
유전자 치료는 제 기능을 하는 확인된 유전자(transgene)가 운반체(carrier) 또는 벡터에 포장돼 환자에 투여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맥으로 벡터가 주입되면, 이는 체내에서 관심/표적 장기로 이동한다. 표적 세포에 다다른 유전자는 세포의 핵 내로 들어가 전사/번역돼 질환과 관련된 단백질을 생성한다.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유전자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이동시키는 벡터의 역할이 크다. 특히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아데노연관바이러스(AAV) 벡터는 병원성이 없으며 장기간 유전자 표현이 가능하다. 항원형(serotype) 또한 다양해 특정 장기를 목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유전자를 넣을 수 있는 용량도 넉넉하다.
그러나 반대로 벡터 또는 항체의 존재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유전자치료에 쓰이는 벡터와 유전자가 면역 시스템에서 외부 침투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체내 면역 반응을 유발시켜 결국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는 한 환자에게 1회만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다른 문제점은 환자가 벡터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반응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항체는 벡터 표면인 캡시드(capsid)와 반응해 벡터가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같은 벡터를 이용한 재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면역 반응이 없는, 즉 항체가 없는 환자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부분은 현재 The ELISPOT으로 벡터 표면에 대한 세포면역계의 T-세포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면역반응을 고의적으로 낮추는 방법도 모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정립된 부분은 없다.
또 유전자치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헬스케어 제공과 비용부담에 대한 접근성 증가를 필요로 하며, cGMP 규정에 맞게 충분한 양의 벡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량 생산 기술 발달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치료의 잠재적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평가된다. 가장 가깝게는 면역결핍 질환, 신경계질환, 혈우병, 안과질환 등 단일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하는 단일 유전질환(monogenic disease)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 외에도 만성질환이거나 희귀질환 등 적극적인 치료법이 없는 질환에서 완치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
현재 일부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여러 유전자치료제의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혁신적인 유전자치료제가 개발돼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SCL사이언스,펜타메딕스 인수..개인 맞춤형 ... -
02 제이엘케이, AI 뇌경색 회복 예측 연구 결과... -
03 파미셀 “줄기세포 치료, 알코올성 간경변 환... -
04 "데이터 안 모으면, 3강 진입 없다" 한국 AI... -
05 셀트리온, 고용노동부 ‘2025 대한민국 일자... -
06 에이테크아이엔씨, ISO 13485 인증 획득..해... -
07 에피바이오텍, 베이징 노스랜드와 JV 설립 ... -
08 문신사법,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 좌... -
09 "한국, 세계 3대 AI 강국 유력" AWS '퍼블릭... -
10 대한한약사회,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소송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