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답 없는 췌장암 신약개발도 ‘AI’로 해결 가능
VCOS 알고리즘, 세포부터 유전자까지 최적 약물 스크리닝 가능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입력 2019-11-28 20:17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췌장암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약물분석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주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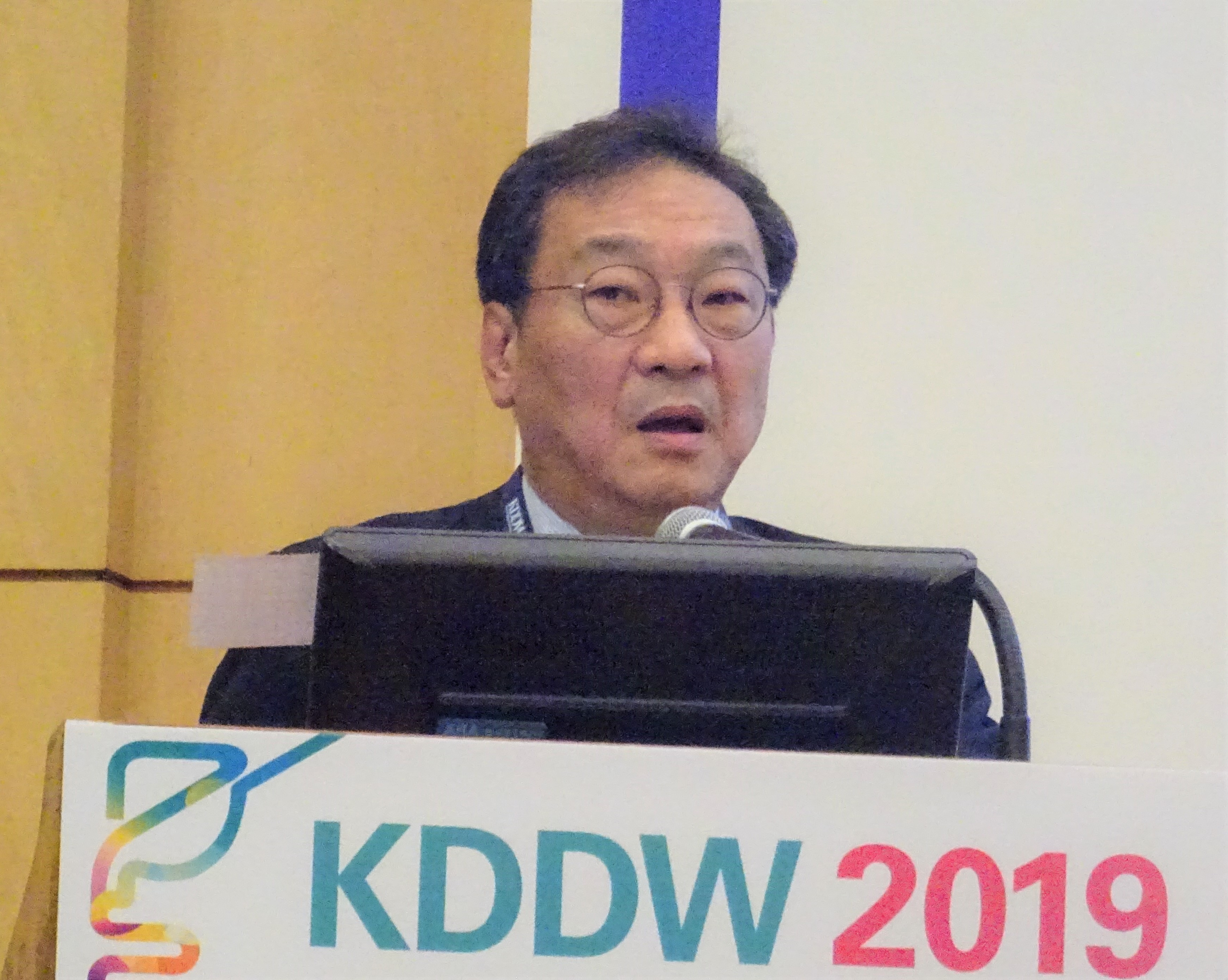
|
송 교수는 “췌장암은 2030년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예상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생존율이 낮은 질환이다”면서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기 진단 방법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췌장암 중 췌관 내 유두 점액종양(IPMN)은 비교적 크기가 크지만 전체 췌장암 케이스의 15%만을 차지한다. 현재의 의료 기술로는 암으로 진행될 병변과 무해한 병변을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전구체 병변이 암인지 검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유럽종양학회(ESMO)의 가이드라인 제시한 췌장암 치료는 전이가 없거나 전이 1기인 췌관세포암(PDAC)은 젬시타빈(Gemcitabine), 결합-파클리탁셀(Nab-Paclitaxel), 폴피리녹스(Folfirinox)을 사용하지만 1년간 반응률은 각각 10%, 23%, 32%로 낮게 나타났다.
최근 PD-1 항체를 기반으로 하는 면역항암제 옵디보, 니볼루맙, CAR-T 세포치료제인 킴리아, 방사선면역 치료요법, 게놈 유전자 편집 등 많은 신약들이 나오고 있지만 췌관세포암에는 아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교수는 “췌관세포암 연구의 93%는 임상1, 2상 진행 중이며 단 7%만이 3, 4상을 승인 받았다. 임상 1상을 받는 데 평균 10.6년이 걸린다”며 “다른 종양의 경우 평균 9.3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췌장암 치료제 개발은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연구가 조기진단과 약물개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며 “딥러닝 기술로 타깃 선정부터 임상대상 선정까지 신약 개발의 큰 격차를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예시로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개발 중인 VCOS(Virtual Target/hit Co-Screening Platform)는 췌장암 환자의 유전자와 단백질 샘플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로 논문에 게재된 타깃, 사용가능한 화합물, 주요 타깃 등을 조합해 가장 이상적인 치료제 모델을 찾는다.
연구팀은 췌장암 환자 및 약제 내성세포주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BD-A004라는 물질이 뇌종양,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환자에게서 과발현하는 것을 발견했고 실제 동물 시험한 결과, BD-A004의 억제가 종양의 숫자와 크기를 감소시켰다. 연구팀은 이러한 스크리닝을 통해 더 많은 화합물을 발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기존 약물개발은 평균 3~4년이 걸리고 단 15% 타깃적중률을 보였지만, 연구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간을 6~8개월로 축소하고 적중률도 40%까지 올릴 수 있다”며 “이는 IND 승인까지 임상과정도 1~2년으로 감소해 시간과 비용을 적어도 50%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10년 내에는 5-10개의 바이오마커가 결합한 약물뿐 아니라 정밀 의학에 발맞춘 각 환자에 개별화된 치료제 개발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펩트론,표적항암 항체치료제 후보물질 기술... -
02 심천당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비젠프... -
03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창립 38주년 "지속 투자... -
04 제6회 희귀유전질환 심포지엄, 벡스코 개막…... -
05 정부·기관·기업 합심해 미국 관세 파고 넘는다 -
06 동화약품, 2025 가송 예술상 시상식... 김미... -
07 국민 10명 중 9명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 -
08 현대바이오USA, 미국 MCDC 정회원 공식 승인 -
09 닥터그루트, 북미 코스트코 682개 매장 입점 -
10 제이엘케이, 뇌경색 중증도 AI 자동 분석 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