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활로봇, 국내 발전 위한 ‘핵심’은?
임상 ‘안전성·유효성’ 확보-정부 ‘인프라 구축’ 강조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입력 2019-06-20 06:19 수정 2019.06.20 10:26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50대 이상 뇌졸중 환자가 늘어나면서 ‘재활로봇’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제도적으로 입지가 약해 개발이 이뤄지기 힘들다.
이러한 재활로봇이 국내에서 발전하기 위해선 ‘임상적 뒷받침’과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19일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2019 재활로봇포럼에서는 ‘재활로봇 개발 이후 임상 및 실용화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 발표됐다.

|
고명환 센터장은 “재활로봇의 경우 다품종 소량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한정됐다는 점이다”며 “재활로봇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가격 탄력성은 낮다. 실용화하려면 병원에서의 입지가 필요한데, 병원은 가장 보수적인 곳으로 안전성‧신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제품만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발주자들은 임상연구의 필요성에 집중해야 한다. 재활로봇은 임상에서 항상 ‘페이퍼있냐 없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는 모든 레퍼런스 체계에서 핵심은 결국 ‘논문’이 나와야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센터장에 따르면, 재활로봇 개발에서는 무작위배정임상연구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예비적 성격의 시험을 하기 어렵고 시술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의사, 시험사의 숙련성이나 기술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명환 센터장은 “결국 임상시험에서 파트너가 될 의사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협업을 중심으로 사례연구, 전후연구, 무작위배정연구 순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며 “어떤 주제라도 논문을 많이 내야한다. 많을수록 입지가 높아지고 투자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런 재활로봇의 보편화는 결국 정부의 ‘제도적 인프라 확충’이 관건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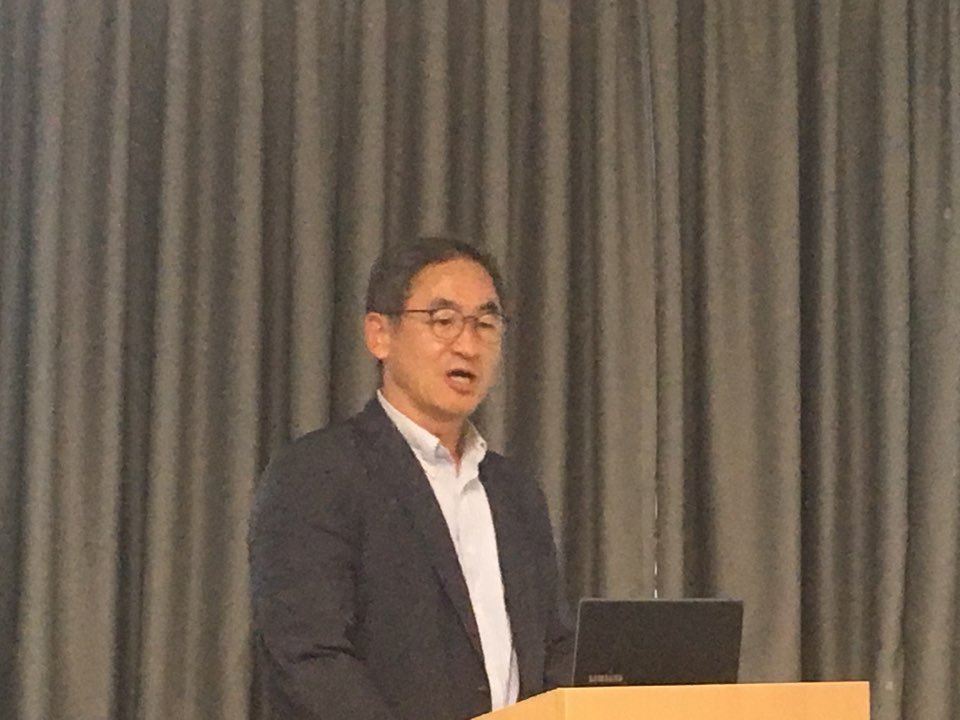
|
또한 “재활로봇의 경우 2등급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로 나눌 수 있다. 3등급부터 로봇으로 인정되는데 의료기기 인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비의료기기 2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또한 재활로봇 치료는 병원에서 이뤄져야하는데 로봇에 대한 기대 수익이 낮아 고가의 로봇 구매가 불가능하고 현재 로봇재활치료 수가가 없어 기존의 물리치료 수가를 적용해 오히려 손해를 본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문 교수는 FDA의 의료 시스템 임상시험 승인 제도(IDE)와 같이 임상시험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을 바탕으로 선시장 진입 후 자료를 보완해, 임상기능은 사용하면서 임상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제품비용에 대한 가치 반영 시, 보다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통한 개별 품목별 제품가 반영, 품목별 급여 혹은 비급여 수가화 차등 적용을 예시로 들었다.
문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으로 의료기기를 인정한다. 기업이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재활로봇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가 ‘입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네오이뮨텍, 유상증자 472억원 조달 성공…"... -
02 오토텍바이오, 퇴행성 타우 뇌질환 신약 ‘AT... -
03 부산시약사회, 의약품 토요 배송 휴무 실태... -
04 뉴라클제네틱스, 황반변성 신약 'NG101' 기... -
05 명인제약, CNS 경쟁력·펠렛 제형 앞세워 코... -
06 셀루메드, 피부이식재 '셀루덤 파워' 제조 ... -
07 뉴메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 볼리... -
08 케어젠,필러 의료기기 인도 CDSCO 등록 완료 -
09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케이캡' 결정형 분... -
10 동방에프티엘, ‘니르마트렐비르’ WHO PQ- W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