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ADHD, ‘생애 주기’ 걸쳐 진행…치료 중요성 높다
적대적 반항장애·자살 시도 나타나…성인은 사회 적응 어려워
전세미 기자 │ jeonsm@yakup.com


입력 2019-04-03 13:03 수정 2019.04.03 13:08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걸쳐 증상과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일 개최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는 ‘ADHD 환자의 생애 주기 별 공존 질환’에 대해 김붕년 교수, 이정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ADHD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애 주기’에 걸쳐 여러 가지 공존병리를 나타내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환자들의 경우, ADHD는 ‘적대적 반항장애’의 기저 질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붕년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는 “전국 4대 권역 만 13세 초등학생 미만 1,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아동의 약 20%가 앓고 있는 적대적 반항장애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소아 10명 중 4명 가량이 ADHD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즉, ADHD가 적대적 반항장애의 기저질환이므로 ADHD 치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반항장애 또한 치료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ADHD를 방치할 경우, 성장 과정에서 공격행동과 비행 행동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
청소년기 ADHD의 주 문제는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국 4대 권역의 만 13세 이상 청소년 998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의하면, 실제 국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10명 중 1.8명은 자살 사고를 시도해본 적이 있다. 성별 차이도 뚜렷하다. 남학생은 10명 중 1명(10.1%), 여학생은 5명 중 1명(22.1%)에서 자살 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 1달 사이에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ADHD 진단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 대비 자살 의도를 가질 확률이 6배 가량 높았다. 뿐만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하는 비율 또한 각각 2배,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DHD는 성인기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주된 문제는 인터넷 게임 및 약물,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 장애‘다.
이정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는 “성인 ADHD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인터넷 게임 중독이 더 만성적으로 진행된다. 또 재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상인 대비 1년 차에서 5배, 2년 차에서는 6배 가량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성인 ADHD 환자의 경우 유아-소아-청소년기를 거치며 이미 적대적 반항장애나 우울증 등의 공존 질환을 경험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ADHD 진단 및 선행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 적응 자체가 어려워 결국은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이정 교수는 지적했다.
ADHD의 공식적인 1차 치료는 ‘약물 치료’다. 약물은 무작위 대조 방법(randomized control)으로 설계된 연구 안에서 대조군을 두고 우월함을 증명해 보인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현재 국내 허가 약물로는 메칠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HCI 서방형 경구제, 아토목세틴(Atomoxetine) HCI 경구제 등이 있다.
반면 임상적 근거(evidance)는 없지만, 효과가 있어 권고되는 방법들도 있다. 부모교육, 상담, 가족치료, 특수교육, 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다. 이들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약물 치료와 병행된다.
김붕년 교수는 “약물이 1차 치료이긴 하지만, 별도로 정해진 치료 기간은 없다. 대게 초등학교 저학년 발병 시에는 약 3년,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기 발병은 더 짧은 기간 사용한다. 치료과정에 대한 기간은 환자마다 다르다. 중요한 지속적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일 개최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는 ‘ADHD 환자의 생애 주기 별 공존 질환’에 대해 김붕년 교수, 이정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ADHD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애 주기’에 걸쳐 여러 가지 공존병리를 나타내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환자들의 경우, ADHD는 ‘적대적 반항장애’의 기저 질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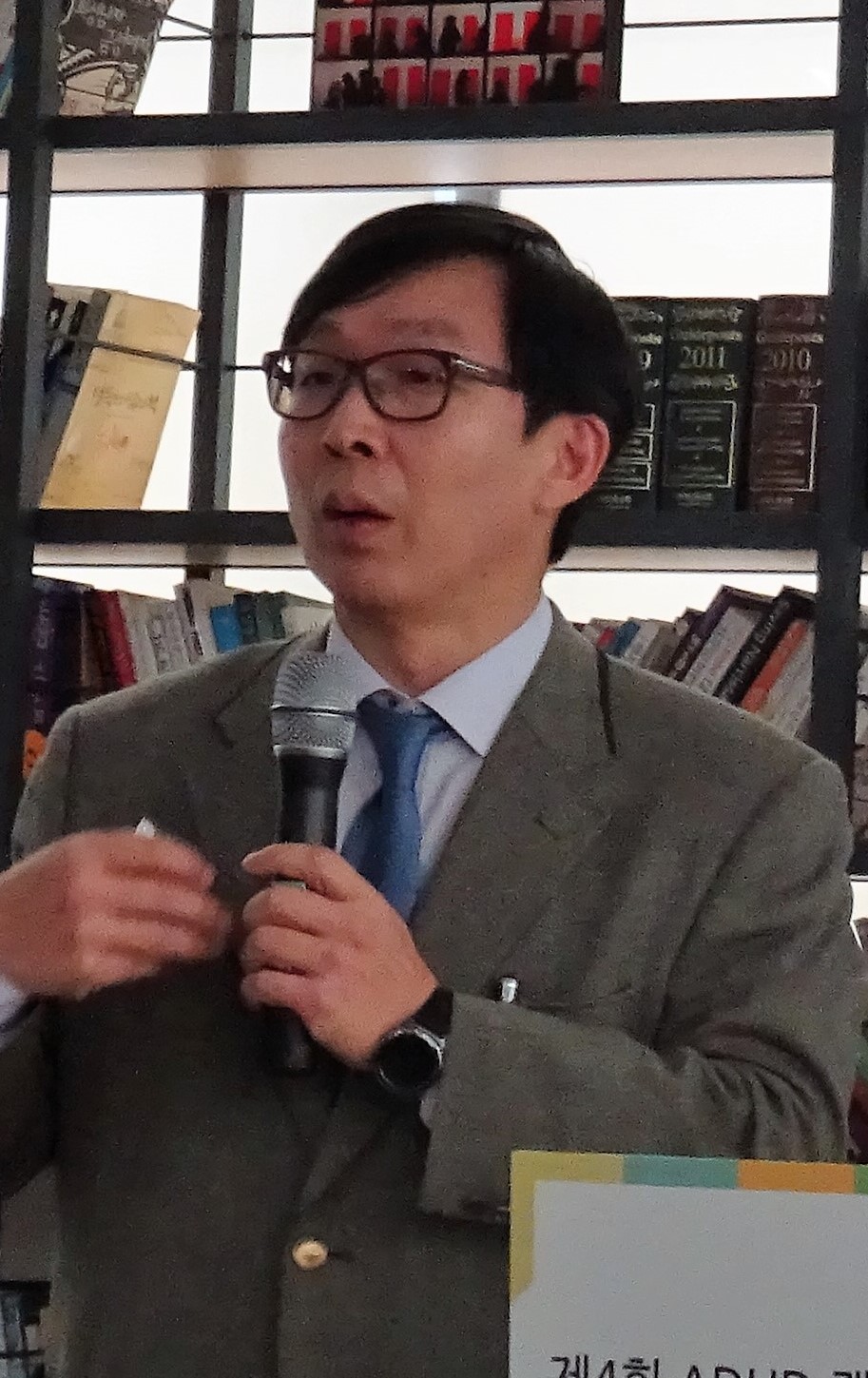
|
즉, ADHD가 적대적 반항장애의 기저질환이므로 ADHD 치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반항장애 또한 치료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ADHD를 방치할 경우, 성장 과정에서 공격행동과 비행 행동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
청소년기 ADHD의 주 문제는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국 4대 권역의 만 13세 이상 청소년 998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의하면, 실제 국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10명 중 1.8명은 자살 사고를 시도해본 적이 있다. 성별 차이도 뚜렷하다. 남학생은 10명 중 1명(10.1%), 여학생은 5명 중 1명(22.1%)에서 자살 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 1달 사이에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ADHD 진단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 대비 자살 의도를 가질 확률이 6배 가량 높았다. 뿐만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하는 비율 또한 각각 2배,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DHD는 성인기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주된 문제는 인터넷 게임 및 약물,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 장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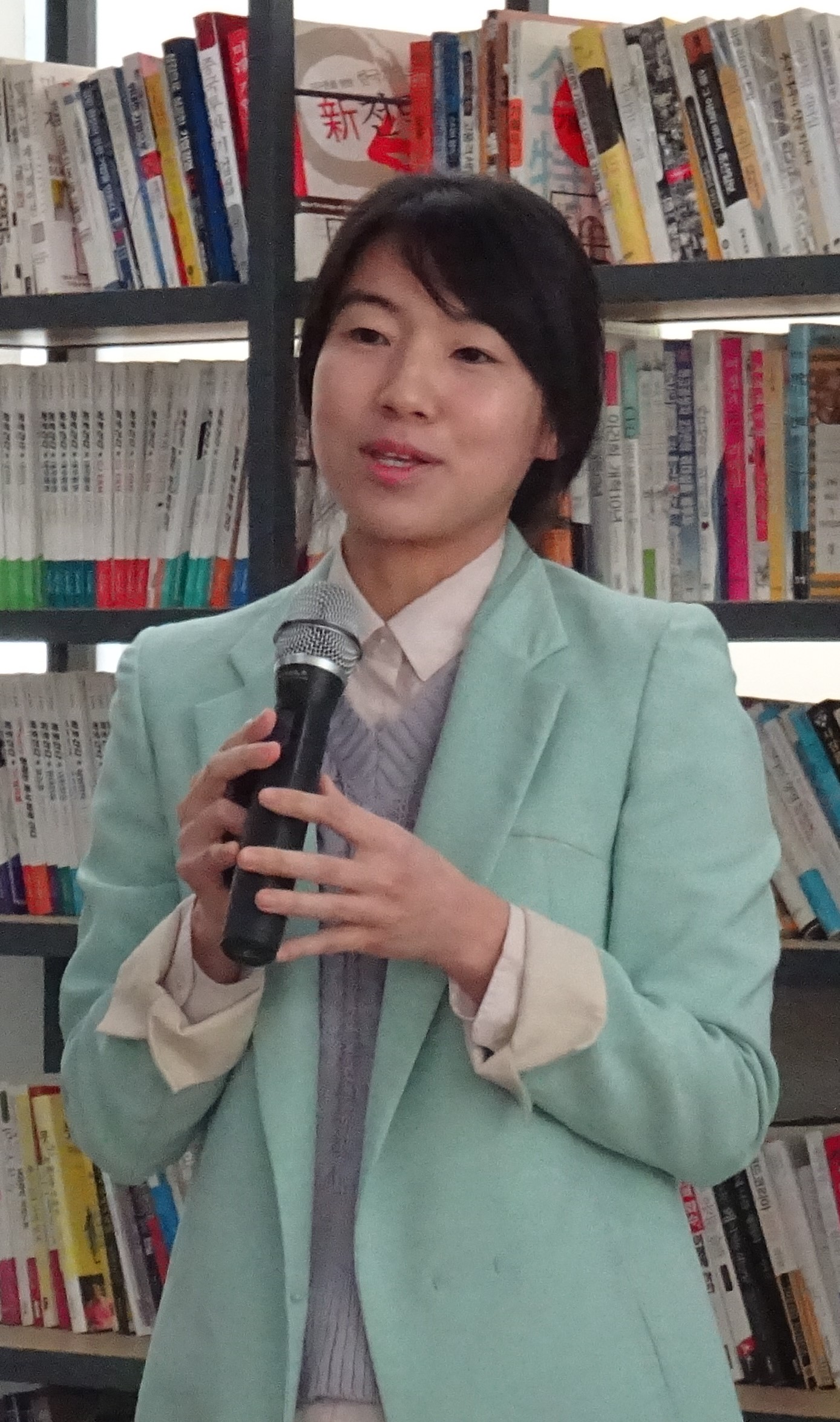
|
이어 “특히 성인 ADHD 환자의 경우 유아-소아-청소년기를 거치며 이미 적대적 반항장애나 우울증 등의 공존 질환을 경험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ADHD 진단 및 선행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 적응 자체가 어려워 결국은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이정 교수는 지적했다.
ADHD의 공식적인 1차 치료는 ‘약물 치료’다. 약물은 무작위 대조 방법(randomized control)으로 설계된 연구 안에서 대조군을 두고 우월함을 증명해 보인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현재 국내 허가 약물로는 메칠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HCI 서방형 경구제, 아토목세틴(Atomoxetine) HCI 경구제 등이 있다.
반면 임상적 근거(evidance)는 없지만, 효과가 있어 권고되는 방법들도 있다. 부모교육, 상담, 가족치료, 특수교육, 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다. 이들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약물 치료와 병행된다.
김붕년 교수는 “약물이 1차 치료이긴 하지만, 별도로 정해진 치료 기간은 없다. 대게 초등학교 저학년 발병 시에는 약 3년,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기 발병은 더 짧은 기간 사용한다. 치료과정에 대한 기간은 환자마다 다르다. 중요한 지속적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에스티젠바이오, APBCEA 2025 CDMO 어워즈 2... -
02 서울시약,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 ... -
03 화해, 글로벌 웹 중국어 버전 정식 출시 -
04 아모레퍼시픽, 인도·인도네시아 대상 임팩트... -
05 코스맥스, 조선 왕실 정취 담은 ‘궁궐 향수... -
06 일동제약 고지혈증 치료제 ‘드롭탑’ 동남아 ... -
07 보령,국내 최대 페니실린 생산기지 증축..필... -
08 트럼프 행정부, 중국산 의약품 허가 제한 ‘... -
09 주사 없이 ‘미세 얼음’으로 약물 전달… 난치... -
10 와이바이오로직스, 장우익 대표이사 사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