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차 허가된 타그리소, 입증된 가치-남은 과제는
EGFR·T790M 변이 선택 작용…1차 급여·내성 가능성은 숙제
전세미 기자 │ jeonsm@yakup.com


입력 2019-01-16 15:16 수정 2019.01.18 10:02
국내 유일 3세대 EGFR-TKI 표적항암제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최근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사용이 허가되며 지금까지 입증한 임상적 가치와 일부 한계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그리소는 지난해 12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한 국내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 이로써 T790M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EGFR 변이 양성 확인만으로도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타그리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타그리소는 과거 1, 2세대 EGFR TKI 제제의 문제점을 찾는 과정에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16일 열린 타그리소 1차 치료 적응증 승인 기자간담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의학부(AstraZeneca Global Medical Affairs) 대런 크로스(Darren Cross) 박사는 “초기 세대 EGFR TKI 제제는 완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물론 표준항암요법보다는 효과가 좋았으나 1년 정도 이후에는 암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크로스 박사에 따르면, 연구를 이어오던 중 2009년 새로운 타입의 EGFR TKI 개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그간 개발됐던 EGFR-TKI 제제는 정상 타입의 WT(Wild type) EGFR도 공격했기 때문에 피부발진, 설사 등과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이를 공격하지 않고도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크로스 박사는 “3세대 TKI에 대한 개념은 지금은 흔하게 알려져 있지만 2009년 당시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고 선례가 없었다. 높은 활성변이에 대한 효능을 보였어야 했고, EGFR 변이에 대한 선택성 또한 높아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연구팀은 컴파운드 라이브러리(conpound library) 검색 끝에 변이에 대한 선택성이 높은 물질을 찾아냈고, 개발 초기 변이에 대한 활성이 높은 물질과는 다른 물질로 평가된 이 물질이 바로 지금의 타그리소였다.
크로스 박사는 “이 물질들에 대한 역가(potency)를 다듬고 비가역적으로 강력하게 물질끼리 결합했다. 안전성에 대한 접근도 중요했다. 화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변이에서는 높은 활성을 보이고 선택성을 조절할 수 있었다. WT EGFR에 대한 선택성을 낮춤으로써 피부발진과 같은 독성을 줄여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타그리소는 EGFR 민감성 변이 및 T790M 내성변이에 강력하고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3세대 EGFR TKI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남은 것은 역시 ‘급여’ 문제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명주 교수는 “1차 EGFR TKI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환자 중 T790M 변이 양성으로 확인돼 2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전체 환자의 30%에 불과하다. 이 30%만이 타그리소로 2차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그리소가 1차 치료로 허가가 되면 EGFR 유전자 변이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타그리소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약제의 처방 활성화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렵다.
미국 국가 종합 암 네트워크(NCCN)는 2019년 개정한 비소세포폐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EGFR 변이 양성 환자의 1차 치료를 위한 약제 중 타그리소를 가장 높은 권고 등급인 Category 1 중에서도 유일한 선호요법(preferred)으로 권고하고 있다.
안 교수는 “타그리소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1차 치료로 쓰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보험 적용이 되면 적극적으로 처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치료제는 내성이 생긴다. 타그리소는 아직까지 발견된 내성은 없지만, 내성 기전에 근간해 이 저항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숙제가 될 것이다. 또 타그리소의 3상 임상 결과 무진행생존기간이 18.9개월인데, 이 기간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그리소는 지난해 12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대한 국내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 이로써 T790M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EGFR 변이 양성 확인만으로도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타그리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타그리소는 과거 1, 2세대 EGFR TKI 제제의 문제점을 찾는 과정에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
크로스 박사에 따르면, 연구를 이어오던 중 2009년 새로운 타입의 EGFR TKI 개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그간 개발됐던 EGFR-TKI 제제는 정상 타입의 WT(Wild type) EGFR도 공격했기 때문에 피부발진, 설사 등과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이를 공격하지 않고도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크로스 박사는 “3세대 TKI에 대한 개념은 지금은 흔하게 알려져 있지만 2009년 당시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고 선례가 없었다. 높은 활성변이에 대한 효능을 보였어야 했고, EGFR 변이에 대한 선택성 또한 높아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연구팀은 컴파운드 라이브러리(conpound library) 검색 끝에 변이에 대한 선택성이 높은 물질을 찾아냈고, 개발 초기 변이에 대한 활성이 높은 물질과는 다른 물질로 평가된 이 물질이 바로 지금의 타그리소였다.
크로스 박사는 “이 물질들에 대한 역가(potency)를 다듬고 비가역적으로 강력하게 물질끼리 결합했다. 안전성에 대한 접근도 중요했다. 화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변이에서는 높은 활성을 보이고 선택성을 조절할 수 있었다. WT EGFR에 대한 선택성을 낮춤으로써 피부발진과 같은 독성을 줄여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타그리소는 EGFR 민감성 변이 및 T790M 내성변이에 강력하고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3세대 EGFR TKI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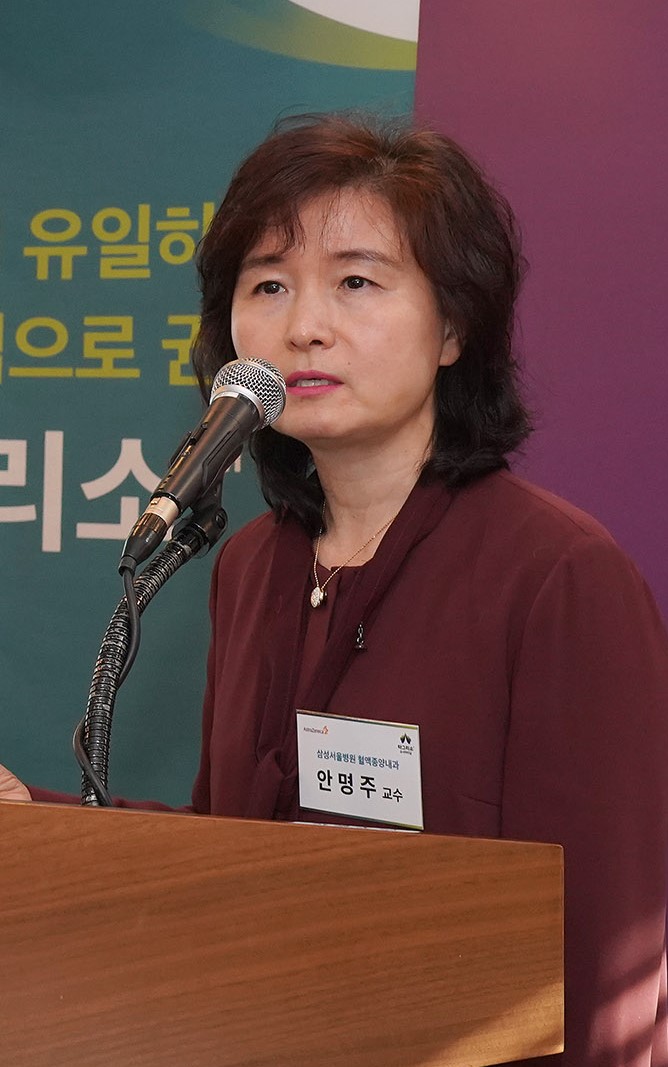
|
타그리소가 1차 치료로 허가가 되면 EGFR 유전자 변이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타그리소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약제의 처방 활성화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렵다.
미국 국가 종합 암 네트워크(NCCN)는 2019년 개정한 비소세포폐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EGFR 변이 양성 환자의 1차 치료를 위한 약제 중 타그리소를 가장 높은 권고 등급인 Category 1 중에서도 유일한 선호요법(preferred)으로 권고하고 있다.
안 교수는 “타그리소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1차 치료로 쓰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보험 적용이 되면 적극적으로 처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치료제는 내성이 생긴다. 타그리소는 아직까지 발견된 내성은 없지만, 내성 기전에 근간해 이 저항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숙제가 될 것이다. 또 타그리소의 3상 임상 결과 무진행생존기간이 18.9개월인데, 이 기간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네오이뮨텍, 유상증자 472억원 조달 성공…"... -
02 오토텍바이오, 퇴행성 타우 뇌질환 신약 ‘AT... -
03 부산시약사회, 의약품 토요 배송 휴무 실태... -
04 뉴라클제네틱스, 황반변성 신약 'NG101' 기... -
05 명인제약, CNS 경쟁력·펠렛 제형 앞세워 코... -
06 셀루메드, 피부이식재 '셀루덤 파워' 제조 ... -
07 뉴메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 볼리... -
08 케어젠,필러 의료기기 인도 CDSCO 등록 완료 -
09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케이캡' 결정형 분... -
10 동방에프티엘, ‘니르마트렐비르’ WHO PQ- W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