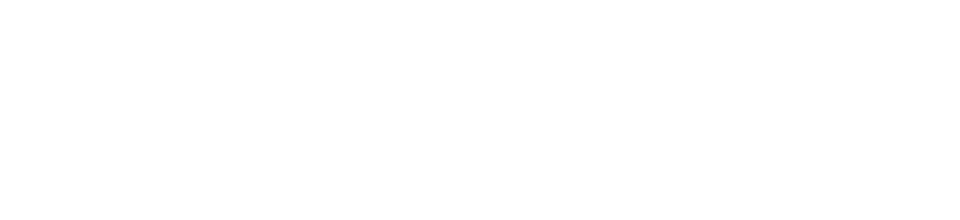아스트라제네카社가 향후 10년 이내에 의약품 생산 부문을 100%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제약(製藥) 기업을 탈피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아스트라제네카社의 데이비드 스미스 부회장(COO)은 17일 한 영국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생산 부문은 우리의 핵심파트(a core activity)가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스미스 부회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수한 수준으로 각종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미스 부회장은 “앞으로 우리는 R&D와 마케팅 부문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약원료(active ingredients) 부문에 대한 아웃소싱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아스트라제네카가 우수한 지적재산권과 연구역량, 브랜드 파워, 품질,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그 이외의 부문들은 아웃소싱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다만 생산 부문에 대한 아웃소싱은 절차에 준해 단계별로 진행될 것이라고 스미스 부회장은 언급였다. 가령 법적인 문제 등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아웃소싱이 완료될 수 있기까지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이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전 세계 19개국에 27곳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스미스 부회장은 생산 부문 아웃소싱 이후의 대안으로 아시아시장의 경우 위탁생산 방식이 채택될 것임을 언급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에 생산 부문 아웃소싱의 상당몫이 맡겨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스미스 부회장은 지난 7월말 총 7,600명 규모(전체 재직인력의 11%)의 감원계획이 공개되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회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작업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천식 치료제 ‘심비코트’(부데소나이드+포르모테롤)와 정신분열증 치료제 ‘쎄로켈’(쿠에티아핀), 유방암 치료제 ‘아리미덱스’(아나스트로졸) 등 현재 한해 매출의 38%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주력제품들이 차후 5년 이내에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는 형편이다.
-
01 상장 바이오헬스기업 ,3Q 누적 성장성 전년... -
02 파로스아이바이오, 바이오 전문 대형 VC서 1... -
03 네이처셀,CLI 환자 대상 줄기세포치료제 '... -
04 [2025년 결산] "첨단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
05 심장 비대의 이면에 숨은 희귀질환…"파브리... -
06 바이오마린, 희귀질환 전문 BT기업 48억달러... -
07 [2025년 결산] 약국 질서 흔든 ‘대형화 시... -
08 [2025년 결산 ] 13년 만의 약가 대수술…‘제... -
09 [2025년 결산] "허가 속도가 바뀌었다"…2025... -
10 [인터뷰]"'계면활성제 없는 세정' 새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