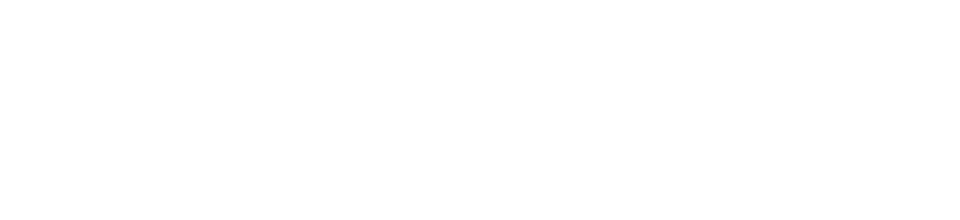뉴스
신약개발 소용비용 17억 달러로 상승
美 제약산업 "70년대 철강산업과 유사한 상황"
이덕규 기자 │ abcd@yakup.com


입력 2003-12-09 18:41 수정 2003.12.12 10:45
제약기업이 한 개의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총 17억 달러에 육박하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새로운 추정치가 공개됐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8일자에서 미국 매사추세츠州 보스턴에 소재한 컨설팅회사 베인&컴퍼니社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이 신문이 인용한 보고서에서 베인측은 "현재 상당수의 제약기업들은 블록버스터 제품들의 특허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만료시기에 임박하면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베인社는 "메이저 제약기업들의 경우 위험확률이 높은 제품들에 도박을 거는 기존의 전략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지난 1970년대에 미국의 철강업계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1900년대 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 세계를 주도했던 미국의 철강기업들이 1970년대 이후로 일본과 한국 등에 주도권을 넘겨주었던 전례에 제약기업들의 현실을 접목시킨 것은 흥미로운 대목. 실제로 당시 고로(高爐) 업체들은 고사직전의 위기로 내몰려야 했었다.
특히 베인측은 "지난 2000~2002년 기간 동안 제약기업들이 다양한 단계의 R&D에 지출한 금액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 한개의 신약을 개발해 FDA의 허가를 취득하고 미국시장에 발매할 수 있기까지 소요되는 평균적인 투자비용 규모는 17억 달러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상시험에 소요되었던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제약기업들의 R&D 생산성이 높은 편이었던 지난 1995~2000년 기간의 평균 11억 달러 규모에 비하면 부담이 55%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신약에 대한 투자수익률(ROI)은 5% 수준으로 크게 떨어져 신약 6개 중 1개 품목 정도만이 투자금액을 보상해 줄만 수준의 이익을 제약업체측에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베인측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매사추세츠州 보스턴에 소재한 터프츠大 부속 신약개발연구센터(TCSDD) 조사팀은 지난 2001년 "한개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8억2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한 바 있다.
터프츠大 연구팀은 또 올해 5월에는 한 개 신약당 8억9,700만 달러의 비용이 투자되고 있다며 새로운 통계치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베인社의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프레스턴 헨스케 부회장은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론과 상이한 기준이 동원되었던 만큼 터프츠大 연구팀이 제시했던 통계치와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즉, 터프츠大측이 통계과정에서 감안하지 않았던 발매(commercialization) 비용 등까지 포함되었음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8일자에서 미국 매사추세츠州 보스턴에 소재한 컨설팅회사 베인&컴퍼니社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이 신문이 인용한 보고서에서 베인측은 "현재 상당수의 제약기업들은 블록버스터 제품들의 특허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만료시기에 임박하면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베인社는 "메이저 제약기업들의 경우 위험확률이 높은 제품들에 도박을 거는 기존의 전략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지난 1970년대에 미국의 철강업계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1900년대 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 세계를 주도했던 미국의 철강기업들이 1970년대 이후로 일본과 한국 등에 주도권을 넘겨주었던 전례에 제약기업들의 현실을 접목시킨 것은 흥미로운 대목. 실제로 당시 고로(高爐) 업체들은 고사직전의 위기로 내몰려야 했었다.
특히 베인측은 "지난 2000~2002년 기간 동안 제약기업들이 다양한 단계의 R&D에 지출한 금액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 한개의 신약을 개발해 FDA의 허가를 취득하고 미국시장에 발매할 수 있기까지 소요되는 평균적인 투자비용 규모는 17억 달러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상시험에 소요되었던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제약기업들의 R&D 생산성이 높은 편이었던 지난 1995~2000년 기간의 평균 11억 달러 규모에 비하면 부담이 55%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신약에 대한 투자수익률(ROI)은 5% 수준으로 크게 떨어져 신약 6개 중 1개 품목 정도만이 투자금액을 보상해 줄만 수준의 이익을 제약업체측에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베인측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매사추세츠州 보스턴에 소재한 터프츠大 부속 신약개발연구센터(TCSDD) 조사팀은 지난 2001년 "한개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8억2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한 바 있다.
터프츠大 연구팀은 또 올해 5월에는 한 개 신약당 8억9,700만 달러의 비용이 투자되고 있다며 새로운 통계치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베인社의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프레스턴 헨스케 부회장은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론과 상이한 기준이 동원되었던 만큼 터프츠大 연구팀이 제시했던 통계치와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즉, 터프츠大측이 통계과정에서 감안하지 않았던 발매(commercialization) 비용 등까지 포함되었음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신약개발 소요비용 평균 9억달러 육박
2003-05-14 19:43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제테마, 2Q 매출액 200억원으로 사상 최대…... -
02 더바이오메드 “종속회사 자료 미제공으로 올... -
03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미국 임상 임박·일... -
04 나이벡, 2Q 영업익 83억원 전년 동기比 2724... -
05 메지온 "운동 기능 저하 폰탄 환자 '유데나... -
06 휴온스글로벌, 2Q 매출 1.4%↑ 2,127억·영업... -
07 대한면역학회, 10월 30일 'KAI Internation... -
08 노바렉스, 또 사상 최대 분기 실적…2Q 매출·... -
09 바이오노트, 상반기 매출 609억원·영업익 11... -
10 셀트리온제약, 2Q 매출 1313억원, 영업익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