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의료 질 문제,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이 해결점”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 위한 명확한 제시와 로드맵 필요 강조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입력 2019-06-14 12:44 수정 2019.06.14 12:49
병상 수 대비 의사 부족 등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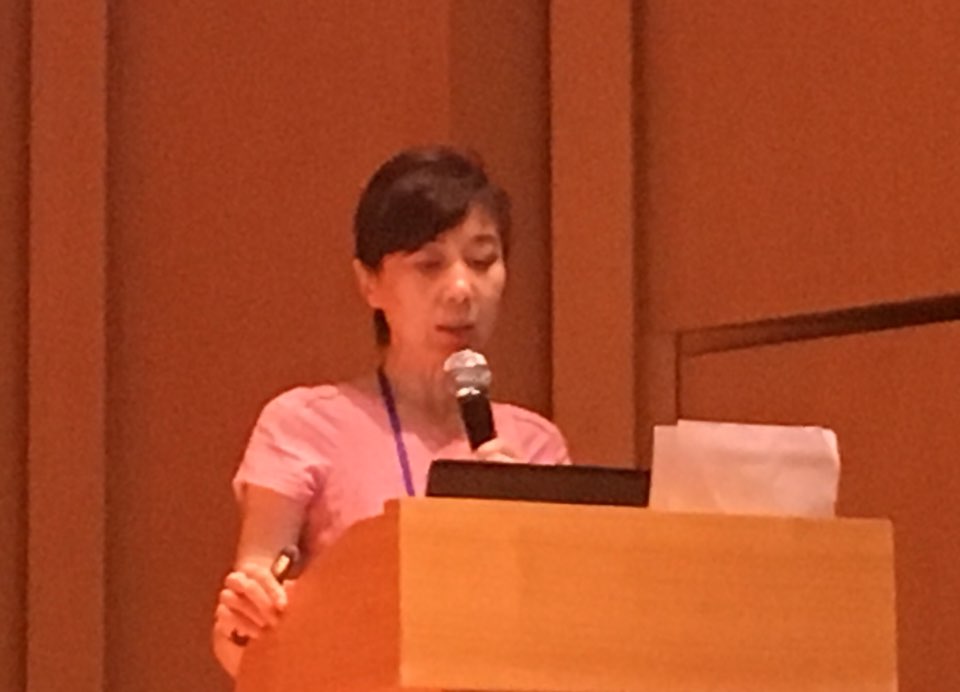
|
최근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질 저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의료이용 및 비용증가 문제와 더불어 병상 수 증가에 비례한 의사 수는 떨어지고 있다.
이에 박하영 교수는 “의료체계의 질, 비용, 접근성 문제는 해외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이들 국가들은 의료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의 보건의료 추진방향에서 미래 기술의 발전을 빼놓을 수 없으며 그 중에서도 인공기능 가치창출, 즉 디지털 헬스케어에 큰 잠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CMS 사례를 예로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의료정보기술 EHR, APM, MIPS 등을 활용한 질 모니터링․보상․진료비지불제도를 실시한 결과 2018년 OECD 건강 통계상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에서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의료체계 문제해결의 기회의 창이다. 진료 연속성, 환자 안전 문제의 예측과 예방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며 “이러한 정보기술의 활용은 국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정책도구(레버리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가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의료정보 프로젝트들이 국가의료체계와 국민의 관점에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고 과정도 목표 지향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나 익명 여부보다는 국민이나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이슈를 어떻게 정보사업으로 펼쳐나갈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국가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전면적 시행(scale-up)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아직까지 개발자 위주의 연구, 비용 문제를 해결할 플랫폼 부재, 각 부서 위주로 따로 노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
이에 박하영 교수는 ‘거버넌스’의 구축을 강조했다. 국내 디지털헬스 케어를 위한 유관 정부 조직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정부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AI 진단 등 디지털서비스 행위별 수가형태 인센티브 제도, 개인정보 오남용 발생 시 사후적 제제장치에 맞춘 행정 완화 등의 의료정보법 개선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의료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국가가 참여하는 플랜으로 가야한다”며 “무엇보다도 의료의 핵심이 되는 의료인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명인제약, CNS 경쟁력·펠렛 제형 앞세워 코... -
02 셀루메드, 피부이식재 '셀루덤 파워' 제조 ... -
03 뉴메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 볼리... -
04 케어젠,필러 의료기기 인도 CDSCO 등록 완료 -
05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케이캡' 결정형 분... -
06 동방에프티엘, ‘니르마트렐비르’ WHO PQ- WH... -
07 OATC, 화장품 향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사 항... -
08 한미약품,당뇨약 멕시코 공급 계약...중남미... -
09 유한양행, 휴이노와 '메모큐' 판매 계약 MOU... -
10 콜마비앤에이치, 서초구청·기빙플러스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