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원발성 증상성 발작, 조기 ‘AED’ 사용 득일까 독일까
기존 뇌병변 혹은 중추신경장애 경우 2.55배 발작 재발가능성 높아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입력 2019-06-13 06:00 수정 2019.06.13 10:30
뇌전증은 초기에 약물로 잡지 않으면 조절이 어려워 위험하지만, AED(antiepileptic drug, 항전간제)의 부작용이 큰 만큼 뚜렷한 원인 없는 경련에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원발성 증상을 보이는 첫 번째 뇌전성 발작 있을 때부터 AED사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재발가능성’ 크기 때문이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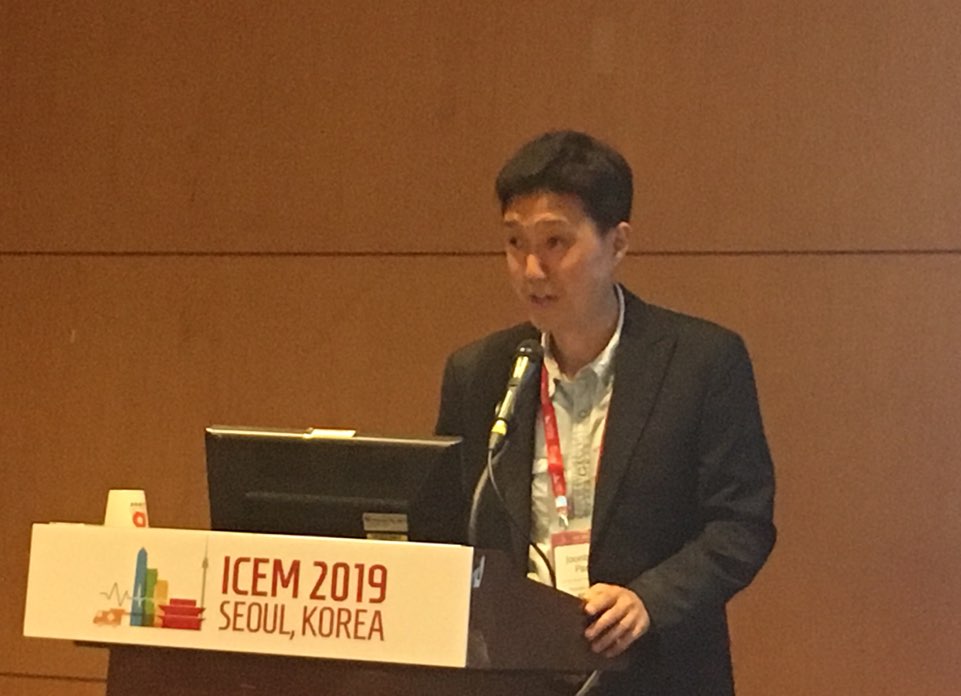
|
뇌전증(간질, epilepsy)은 뇌세포의 무질서한 전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증상인 뇌전성 발작(간질발작, unprovoked seizure)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질환으로, 특히 약물 치료에 실패를 거듭할 경우 발작 조절율이 크게 떨어진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뇌전성 발작 처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발성 증상성이 있다면 재발확률이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AED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원발성 증상성(remote symptomatic, RS)은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신경과적 손상은 가지고 있으나 급격한 유발원인(provocation) 없이 경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박 교수는 “한 논문에 의하면 첫 뇌전성 발작이 있는 208명을 추적관찰한 결과 재발이 일어날 확률이 1년 뒤 14%, 3년 뒤 29%, 5년 뒤 34%였고 원발성 증상성 환자의 경우 재발률이 2.5배 더 높았다”며 “이는 뇌전성 발작 초기에 예방적으로 AED를 사용해야하며 특히 원발성인 경우 투약의 필요성이 더 대두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신경학회와 미국뇌전증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초기 발작 후 첫1-2년 사이에 가장 재발이 많이 일어나는데(5년 동안 재발 일어난 확률 46%, 그 중 1년 사이 32% 발생), 기존 뇌에 병변이 있는 경우 2.55배로 발생률이 더 높았다.
이어 전체 2년 동안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AED의 즉각적 치료가 단기 예후(2년)에서 재발위험률을 35%(95%, 신뢰도 23%-46%)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문제는 AED의 부작용(side effect)이다. 약물마다 다르지만 부작용 발생 비율은 낮게는 7%로부터 높게는 31%까지 나타난다.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카바마제핀(carbamazepine), 페노바비탈(phenobarbital), 페니토인(phenytoin), 발포레이트(valporate)제제로, 흔한 부작용으로는 인지장애, 체중 변화 혹은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중독표피괴사용해(toxic epidermal necrolysis)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부작용을 최소화한 AED 개발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FDA 신약 심사중인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cenobamate)’는 반감기가 길어 1일 1회 치료가 가능하고 우울증과 같은 신경정신학적 문제에도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박 교수는 “최근 국내외 임상에서는 케프라(레비티라세탐)가 보편적으로 처방되고 있다. 12세 이상 소아에게 사용가능하며 부작용이 적은 편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AED의 치료제는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커 환자에 적용 시 충분히 고려돼야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조기 치료는 발작 혹은 뇌전증 환자에게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명인제약, CNS 경쟁력·펠렛 제형 앞세워 코... -
02 셀루메드, 피부이식재 '셀루덤 파워' 제조 ... -
03 뉴메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 볼리... -
04 케어젠,필러 의료기기 인도 CDSCO 등록 완료 -
05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케이캡' 결정형 분... -
06 동방에프티엘, ‘니르마트렐비르’ WHO PQ- WH... -
07 OATC, 화장품 향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사 항... -
08 한미약품,당뇨약 멕시코 공급 계약...중남미... -
09 유한양행, 휴이노와 '메모큐' 판매 계약 MOU... -
10 콜마비앤에이치, 서초구청·기빙플러스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