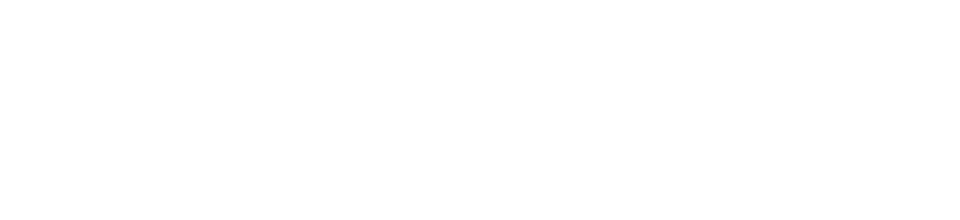SK바이오팜 등 FDA 인허가·직판 성공 사례로 가능성 증명
기술 경쟁만으로는 한계…규제 전략 중요성 부각


|
올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미국 진출이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기술수출을 넘어 직접 FDA 인허가 및 상업화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었고, 그 성과와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과학적 우수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FDA 인허가 전략이 신약 성공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중심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시장조사 기관 IQVIA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의약품 매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한 번의 FDA 승인은 매출, 기업가치, 글로벌 파이프라인 확장의 출발점이 된다. 국내 기업들의 전략이 기술이전 중심에서 직접 진입으로 이동하는 이유다.
올해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SK바이오팜이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엑스코프리)는 2025년 3분기 미국 매출 17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1.9% 성장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4595억원으로 이미 전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이에 힘입어 SK바이오팜은 3분기 매출 1917억원, 영업이익 701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50% 이상 상회했다.
이 성과는 한국 기업이 미국 FDA 허가에 직접 도전해 상업화까지 성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 개발 초기부터 미국 시장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FDA 허가와 현지 직판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 결과, 미국 직판 모델을 통해 고마진 구조와 영업 레버리지를 동시에 입증했다.
NBRx 콘테스트, 소비자 직접 광고(DTC), 처방 차수 확대를 겨냥한 Line of Therapy 전략 등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은 신규 처방 환자 수 증가로 이어졌고, 적응증 및 연령 확장 임상도 병행되고 있다. 미국 시장을 단기 수출 대상이 아닌, 장기 성장 엔진으로 설계한 전략이 실적으로 연결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다. FDA 문턱 앞에서 멈춰선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CRL(보완요청서) 수령 사례가 잇따르며, 승인 실패와 지연의 원인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4월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약업신문이 주관한 ‘2025 BIO Regulatory Innovation Conference’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행사에서 FDA 부국장을 역임한 안컨설팅 안해영 박사는 “이제는 신약의 과학적 탁월성만으로 FDA 문턱을 넘기 어려운 시대”라며 “개발 초기부터 규제기관과 소통하며 인허가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FDA CDER를 통해 승인된 신약은 연간 45~60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패스트트랙, 혁신신약, 가속승인, 우선심사 등 신속허가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우선심사 비중이 56%, 패스트트랙이 44%에 달한다. 승인 자체보다 ‘어떤 경로를 통해 접근했는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다.
안 박사는 특히 희귀질환 전략을 현실적인 돌파구로 제시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독점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임상 비용의 최대 50%에 대한 세액 공제, NDA·BLA 수수료 면제, 가속승인 연계 등 제도적 이점이 따른다. 2018년 이후 CDER 승인 통계를 보면 희귀질환 치료제 승인 건수가 비희귀질환보다 많은 해가 반복됐다.
반면 CRL 사례를 뜯어보면 공통점도 나타났다. 임상 데이터 부족보다 CMC(화학·제조·품질)와 문서 정합성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외주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 구조상, CMO·CRO 관리 미흡이 인허가 리스크로 직결된다.
안 박사는 “CMC는 시설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Pre-IND 단계부터 FDA와 제조 공정, 품질 관리, 위험 완화 전략을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NDA·BLA 단계에서 지적되는 사소한 문서 결함 하나가 승인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FDA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변수로 떠올랐다.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기조가 언급되는 동시에, AI·RWE 도입, 가속승인 요건 명확화 등 심사 기준은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있다. FDA 내부 인력 감축으로 인한 심사 지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기업이 주도적으로 전략을 설계하지 않으면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25년은 K-제약바이오가 미국 시장에서 가능성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해였다. SK바이오팜처럼 성과를 낸 기업이 있는 반면, 승인 지연과 CRL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동시에 존재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과학의 우열이 아니라, 규제 전략의 준비도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FDA 인허가는 개발 막바지 이벤트가 아니라, 신약개발 전체를 관통하는 전략 변수”라며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규제를 장벽이 아니라 설계 대상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을 향한 도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규제 전략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설계했는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학 위에 규제 과학을 얹지 못한 파이프라인은 결국 FDA 문턱에서 속도를 잃게 된다”며 “2025년은 그 차이를 업계가 확인한 해”라고 덧붙였다.
-
01 [2025년 결산 ] 글로벌 R&D 자금 도착지 '한... -
02 [2025년 결산 ] K-AI 신약개발 프로젝트 본... -
03 [2025년 결산] 성분명 처방, 제도화 문턱에 ... -
04 [2025년 결산] K-제약바이오 기술수출 20조... -
05 소비자, 정확한 효능과 가치 이해할 때 지갑... -
06 올해 EU 허가권고 104건..40% 신규조성물 포함 -
07 혁신인가, 붕괴인가…약가 개편안 둘러싼 긴... -
08 [2025년 결산] K-제약바이오 미국 진출 러시... -
09 화장품 중소기업 86.4% "내년 수출 증가할 것" -
10 공직약사 수당 인상, 40년 만의 조정…현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