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장내 미생물’로 위암 정복을? 인간화 마우스 모델 등장
인체 마이크로바이오타 이용해 유사한 환경 조성…면역 체계 등 한계도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입력 2020-10-06 06:00 수정 2020.10.06 07:33
위암을 치료하기 위한 인간화 마우스 모델이 등장했다. 이는 인체 내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 인간의 장 환경과 흡사하게 만들어져 치료제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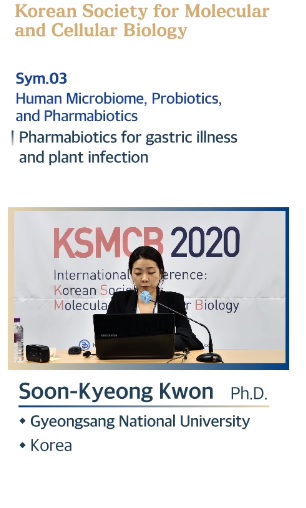
|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마이크로바이오타(미생물군집, 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미생물군유전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오타(microbiota)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비해 미생물 균주 그 자체에 중점을 둔 용어이다.
권 교수는 “위암화와 관련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파마바이오틱스의 발굴 및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며 “위질환 마우스 모델, 메타유전체 분석, 대사체 분석 연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위 질환에 대해 마이크로바이옴의 효능이 입증되면서 치료제 개발로 적극 이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마우스 모델의 경우 인간의 장내 환경과 다른 점이 많아 임상학적 관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위 질환에 있어 마이크로바이옴의 인체 내 기전과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개발 중인 ‘인간화 마이크로바이오타 위질환 마우스 모델’ 연구를 언급했다.
여기서 연구팀은 사람의 위 체부(corpus)와 위 전정부(antrum) 조직으로부터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추출해 무균 마우스의 위 점막에 이식했다. 특히 연구팀은 인간의 위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른 질병 상태를 형성할 때 미생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 인간의 위 마이크로바이오타는 마우스의 위 조직에서 선택적 식민지화 능력을 보였는데, 이는 인간과 쥐 두 개체 간의 위 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마우스 모델에서는 유해균으로 알려진 퍼미큐티스문(Firmicutes phylum)에 속하는 Turicibacter와 Hungatella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헬리코박터균은 비교적 높은 활성화에도 식민화에 실패했다. 또한 숙주와 관련된 특정 미생물 분류군과 특정 질병별 세균 분류군 등도 확인됐다.
권 교수는 “연구 결과, 속(Genus) 수준에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오타 이식 성공율을 계산해 보았을 때 사람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쥐 모델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쥐 모델에서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이 식민지화 되지 않은 점을 분석해 새로운 치료법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체내 면역체계와의 상호 작용, 혹은 하나의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대장암 발생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다각적인 방면으로 접근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아직 임상연구가 진행 중으로 결과를 모두 말할 순 없지만 위암과 같은 위 질환을 잡기 위해선 인간화 마이크로바이오타 마우스 모델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 모델의 활용이 앞으로 이 분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삼성·현대급 글로벌 기업 나와야" 차바이오... -
02 "바이오신약 기업 상장 행렬" 에임드바이오·... -
03 알테오젠 파트너사 MSD, ‘키트루다SC’ 유럽 ... -
04 하엘, 푸단대와 손잡고 주름 개선 신물질 ‘E... -
05 명인제약, 청약 증거금 17조 3,634억원…경쟁... -
06 차바이오텍 CGT 전초기지 '마티카바이오', ... -
07 SK케미칼, 2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 결... -
08 메디톡스, 콜산 성분 지방분해주사제 ‘뉴비... -
09 K-뷰티, 글로벌 확장 속 과제는 ‘변화 대응’ -
10 종근당, 국내 제약업계 최초 AI 기반 지능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