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저소득국 보건 향상 도울 파트너 중요…CEPI와 백신 공동펀딩 논의 중”
김한이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대표, 내년 재단 설립 5주년 앞두고 소회 밝혀
이주영 기자 │ jylee@yakup.com


입력 2022-12-16 06:00 수정 2022.12.16 06:01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기술 역량이 입증된 가운데, 이를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가를 위해 선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 불평등에 시달리는 중저소득국을 돕는 동시에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이면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할 일도 점점 늘고 있다. 신생 재단임에도 불구, 미국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민관협력으로 중저소득국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은 내년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신생 재단이란 이유로 대규모 재단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소신껏 중저소득국 국민의 건강 개선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싶다는 재단의 김한이 대표는 “알맹이를 탄탄하게 채우는 것이 제 철학”이라며 “잊혀져 가는 (열악한 환경의) 질병에 대해 한국 기업 제품을 접근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파트너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제보건 역사에서 유의미한 시기에 놓였다”
김한이 대표는 코로나19 직전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언급하며 한국의 보건의료 잠재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한다면 어느 나라가 대응을 잘할 것인가를 존스홉킨스대가 연구해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톱10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연구 발표 직후 코로나19가 발생했고, 막상 글로벌 팬데믹의 뚜껑이 열리자 당시 연구에서 꼽았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톱10 국가들은 대응을 잘 못하는 나라로 전락했다. 반대로 한국은 급부상했다. 이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목받지 못한 6~7년 전에도, 국제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요건들을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것들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만한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우리 재단의 소망은 한국 국민과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10~20년 안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한이 대표는 재단 설립 5주년이 되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아직 국제보건 펀드라고 하기엔 역사가 짧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지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을 개발하는 게 끝이 아닌, 그에 대한 영향과 의미에 답하는 것이 재단의 내년 과제”라는 김 대표는 “건강 불평등에 시달리는 중저소득국에 공공조달이 되도록 한국 기업을 진출시킬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상업적인 시장 논리가 아닌, 콜레라‧뇌수막염 등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저소득국에 보건의료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공공조달을 맡고 있는 정부나 기구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단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는 “국내 다양한 mRNA 사업단이나 국내 펀딩 사업단이 만든 사업 중 국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걸 논의하기 위해 해외 기구 및 조직들과 밀접하게 소통 중이다. 해외시장, 국내시장을 겨냥한 파트너들이 따로 있다.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보건연구원과도 소통하고 있다.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적극 논의하려고 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공공조달을 위해 유니세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도 적극 접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한국은 비교적 아직 젊은 원조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역량을 보건의료분야에서 어떻게 발휘할 지 고민을 풀어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는 SK바이오사이언스, SD바이오센서 등 9개 민간 파트너사가 함께 하고 있다. 한국 보건의료 역량을 활용해 헬스테크놀로지를 공공재로서 중저소득국에 감염병 질환 완화 목적으로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43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백신과 진단기기 분야가 가장 포트폴리오가 많다. 상업성이 떨어져서 민간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 질병을 대상으로, 중저소득국에 불평등하게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감염병 영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 글로벌 감염병 잠재성이 있으면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15개 질환군을 거쳐 지금까지 23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무엇보다 ‘한국 역량 활용’이 전제라는 것을 강조한다. 컨소시엄 안에서도 최소 1곳은 국내 기관이나 제약기업, 학교, 연구소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WHO 사전승인을 받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백신과 진단기기 과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WHO 사전승인을 받아야 글로벌 펀드나 유니세프 등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혁신 제품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제공돼 도움이 필요한 중저소득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한이 대표 역시 “가장 소외된 곳에 있는 기구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재단이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며 “저희같은 작은 조직이 이런 큰 이슈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돈과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례적이다. 빌게이츠 재단과의 민관협력도 같은 목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당면한 상황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서둘러선 안 된다. 굉장히 깊이 분석하고 사유해야 한다. 그렇게 같이 뛸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며 “내년과 내후년 재단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 함께 갈 계획이다. 눈높이가 비슷한 파트너를 분석해 전략적인 대화를 할 거다. 아직 공개할 순 없지만 진단분야에서 잘 알려진 국제기구와 최근 합의점을 이룬 상태다. 내년 봄쯤 정식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백신 분야에서는 감염병백신연합(CEPI)과 현재 논의 중이다. 다만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커서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oundation: Research Investment in Global Health Technology Foundation)은 우리나라 정부(보건복지부), 국내 생명과학기업,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의 민관협력으로 2018년 7월에 설립된 한국 거점의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기술력이 국가 간 건강 형평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감염병 R&D 과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한국 법인등록명을 재단법인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에서 재단법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으로 변경했다.
생명과학기업 중에서는 종근당, GC녹십자, 제넥신, KT,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니아, 유바이오로직스가 해당 기금에 출연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이면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의 할 일도 점점 늘고 있다. 신생 재단임에도 불구, 미국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민관협력으로 중저소득국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은 내년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신생 재단이란 이유로 대규모 재단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소신껏 중저소득국 국민의 건강 개선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싶다는 재단의 김한이 대표는 “알맹이를 탄탄하게 채우는 것이 제 철학”이라며 “잊혀져 가는 (열악한 환경의) 질병에 대해 한국 기업 제품을 접근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파트너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제보건 역사에서 유의미한 시기에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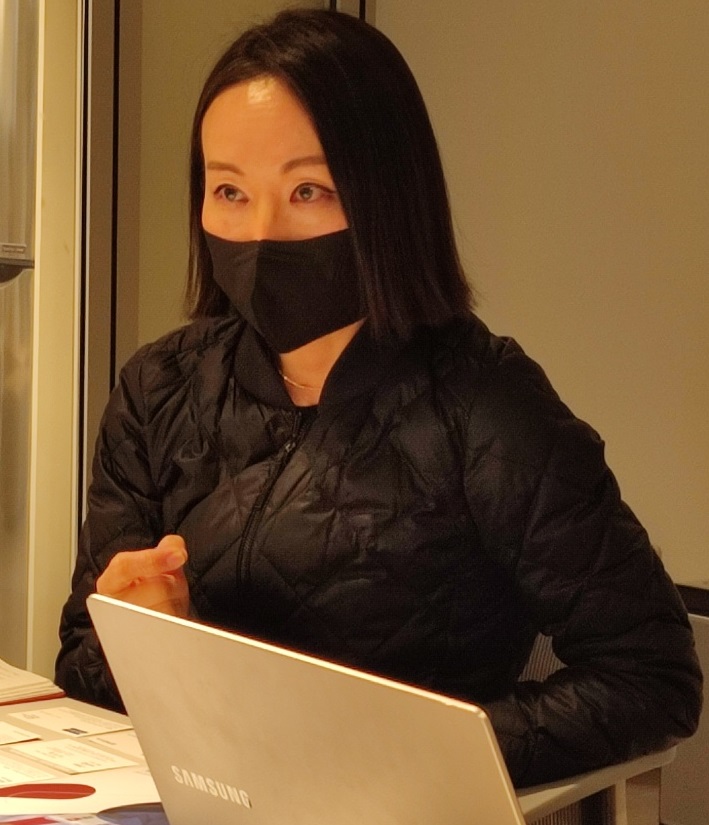
|
그는 “한국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주목받지 못한 6~7년 전에도, 국제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요건들을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것들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만한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우리 재단의 소망은 한국 국민과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10~20년 안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한이 대표는 재단 설립 5주년이 되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은 아직 국제보건 펀드라고 하기엔 역사가 짧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지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을 개발하는 게 끝이 아닌, 그에 대한 영향과 의미에 답하는 것이 재단의 내년 과제”라는 김 대표는 “건강 불평등에 시달리는 중저소득국에 공공조달이 되도록 한국 기업을 진출시킬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상업적인 시장 논리가 아닌, 콜레라‧뇌수막염 등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죽어가는 중저소득국에 보건의료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공공조달을 맡고 있는 정부나 기구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
이 이사는 “한국은 비교적 아직 젊은 원조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역량을 보건의료분야에서 어떻게 발휘할 지 고민을 풀어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는 SK바이오사이언스, SD바이오센서 등 9개 민간 파트너사가 함께 하고 있다. 한국 보건의료 역량을 활용해 헬스테크놀로지를 공공재로서 중저소득국에 감염병 질환 완화 목적으로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43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백신과 진단기기 분야가 가장 포트폴리오가 많다. 상업성이 떨어져서 민간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 질병을 대상으로, 중저소득국에 불평등하게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감염병 영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미래 글로벌 감염병 잠재성이 있으면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15개 질환군을 거쳐 지금까지 23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무엇보다 ‘한국 역량 활용’이 전제라는 것을 강조한다. 컨소시엄 안에서도 최소 1곳은 국내 기관이나 제약기업, 학교, 연구소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WHO 사전승인을 받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백신과 진단기기 과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WHO 사전승인을 받아야 글로벌 펀드나 유니세프 등 조달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혁신 제품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제공돼 도움이 필요한 중저소득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한이 대표 역시 “가장 소외된 곳에 있는 기구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재단이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며 “저희같은 작은 조직이 이런 큰 이슈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돈과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례적이다. 빌게이츠 재단과의 민관협력도 같은 목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당면한 상황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서둘러선 안 된다. 굉장히 깊이 분석하고 사유해야 한다. 그렇게 같이 뛸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며 “내년과 내후년 재단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 함께 갈 계획이다. 눈높이가 비슷한 파트너를 분석해 전략적인 대화를 할 거다. 아직 공개할 순 없지만 진단분야에서 잘 알려진 국제기구와 최근 합의점을 이룬 상태다. 내년 봄쯤 정식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백신 분야에서는 감염병백신연합(CEPI)과 현재 논의 중이다. 다만 규모가 저희보다 훨씬 커서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oundation: Research Investment in Global Health Technology Foundation)은 우리나라 정부(보건복지부), 국내 생명과학기업,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의 민관협력으로 2018년 7월에 설립된 한국 거점의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기술력이 국가 간 건강 형평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감염병 R&D 과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한국 법인등록명을 재단법인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에서 재단법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으로 변경했다.
생명과학기업 중에서는 종근당, GC녹십자, 제넥신, KT,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니아, 유바이오로직스가 해당 기금에 출연 중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동국제약, 삼양홀딩스 ‘니코스탑'- ‘류마스... -
02 에스티큐브,비소세포폐암에서 BTN1A1 타깃 ... -
03 화해, 상품 링크로 수익 창출하는 ‘뷰티 편... -
04 텐텍, 차세대 3라인 하이푸 장비 ‘텐트리플'... -
05 GC녹십자, 태국 적십자사와 전략적 업무협약... -
06 젬백스, 진행성핵상마비 연장 임상 중간 결... -
07 대봉엘에스, 상반기 호실적…K-뷰티 핵심소재... -
08 온코닉테라퓨틱스 P-CAB 신약 자큐보 중국 ... -
09 차병원·차헬스케어·카카오헬스케어, 과천 막... -
10 로킷헬스케어,미국 대형 GPO ‘Alliant Pu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