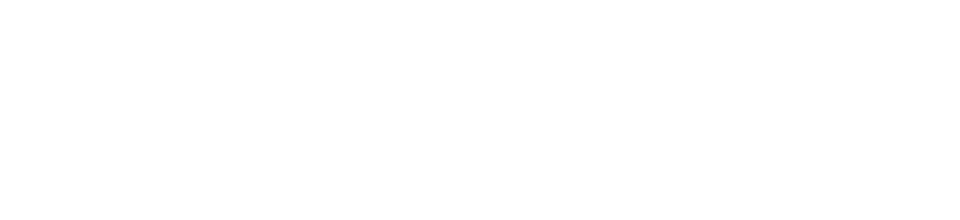규제당국 넘어 개발사 책임 환경·규제 이해도 문제도 해결해야


|
국내에서의 임상 승인 어려워 결국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를 위한 식약당국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만 변화하는 과정에서 식약당국에 모든 행정적·도의적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적극행정’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는 23일 충북 오송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재단의 엑소좀 치료제 지원에 대한 다가올 결실과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KBioHealth는 지난 2021년 규제과학지원단을 구성, 개발 전략 수립을 비롯해 규제지원과 특성분석, 제조공정의 최적화, 유효성 평가, 후보물질 최적화 등 국내 기업의 신약 개발을 위한 DCRM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와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샵 등 각종 규제지원사업만 8개를 진행하고 있다.
KBioHealth에 따르면, 현재 엑소좀 치료물질이 국내에서 임상 승인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국내에서 국내 기업이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원단과 함께 임상을 준비했던 일리아스의 경우 호주로 경로를 바꿔 지난 2022년 4월 임상 1상에 착수했고, 지난 10월에는 1상을 마무리했다. 엑소스템텍은 식약처에 신청한 임상 1상 계획이 지난해 4월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듯 국내 기업이 임상을 위해 해외로 눈 돌리는 이유에 대해 김종원 단장은 ‘한국 규제 환경의 제한적인 성격,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조심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FDA와 한국 식약처 간의 유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승인에 대한 국내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임상 전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에 너무 중점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단장은 “FDA와 TGA는 기준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FDA의 경우 식약처와 같은 자료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임상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임상시험 허가를 위해선 GMP 상 임상시험물질 제조 적합성과 품질 CMC 관련 서류, 비임상의 약리독성시험자료, IND를 포함한 안유시험 자료 등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은데, 엑소좀의 경우 쉽게 갖추기 어려운 서류가 많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엑소좀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크지 않은 바이오벤쳐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개발하는 기업의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탄탄하지 않은 것. 업계는 관계자들은 이로 인해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서류에 대한 컨설팅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임상 과정에 진입하기 전 모든 자료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뒤쳐져 버린다고 이야기한다. 즉 식약처가 임상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단장은 “엑소좀 치료제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승인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호주 TGA를 예시로 들었다. 김 단장에 따르면, 호주와 같은 다른 국가의 규제 환경은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호주 TGA는 제조 공정과 특성 분석 관련 자료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임상용 의약품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에서 제조됐는지, 그리고 실제 인체 투여에서 안전성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이후 의약품의 상업화 과정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추가 요구하는 등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김 단장은 안전성과 임상용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상을 위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됐을 때, 규제당국이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맞는다면 임상을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식약처의 전향적인 태도만이 국내 엑소좀 치료제 개발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김 단장은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당국에 지는 책임이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규제당국이 임상 승인 혹은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제약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만큼 제약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약화 사고에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과하는 불법행위법과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제조사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국내의 경우 식약처가 임상 승인이나 허가를 내줬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보다는 관리·감독하는 식약처에 칼 끝이 향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도의적 책임을 크게 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소송 등의 책임에서도 규제당국 전체가 아닌 심사를 맡은 특정 개인 공무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규제당국은 효과성 및 안전성을 해외 규제당국보다 엄격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을 억제하기보다는 지원하도록 규제 정책을 조정해야 한국이 글로벌 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해도가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단 관계자는 “업계가 기술 개발 과정에서 규제에 필요한 기준을 잘 익히지 못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다”며 “임상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규제들을 업체 스스로가 직접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엑소좀 개발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01 건강기능식품은 내수 전용, 인식 벗을까? -
02 휴온스그룹, 창립 60주년…글로벌 헬스케어 ... -
03 프로젠, 유럽 당뇨병학회서 'PG-102' 연구성... -
04 미국 FDA, 의약품 '보안요구서한'(CRL) 202... -
05 뉴로핏 "10년간 뇌질환 영상 진단만 팠다…26... -
06 옵디보·여보이, 간세포암 1차 치료 대한 적... -
07 “살아남을 시간이 없다”… 빌로이, 전이성 위... -
08 에피바이오텍,모낭 싱글셀 분석- 탈모 원인 ... -
09 화해,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딩 프로그램 정... -
10 롯데바이오로직스 "앱티스와 차세대 ADC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