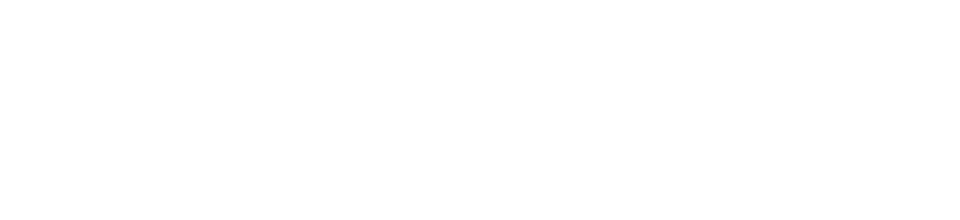뉴스
정부의 뇌전증 환자 지원, '신약' 문제만 쏙 빠졌다?
"연구, 수술장비 등 지원보다 약물 난치성 환자 위한 신약 제도 개선 우선"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입력 2020-11-12 06:00 수정 2020.11.12 15:02
정부는 뇌전증 환자를 위해 연구, 장비 등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신약’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약물 난치성 환자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난치질환인 뇌전증과 관련해 정부 사업 성과로 여겨졌던 신약 개발에 관한 문제점이 거론됐다.

|
강 의원이 언급한 해당 뇌전증 신약은 범부처신약개발 사업 과제로 선정돼 112억 원의 연구비 지원받아 개발에 성공, FDA 허가를 획득해 올해 5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국내에서는 '치료 목적 사용'으로 승인 받아 허가 전인 국내에서 기존 글로벌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들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상황.
강 의원은 “해당 약물은 이제야 국내 임상3상에 진입해, 국민이 신약의 혜택을 보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 개발사가 최초 기획 단계부터 시장성을 고려해 미국은 FDA 승인 후 직접 판매, 유럽은 기술이전 방식으로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개발한 신약의 혜택을 큰 국가만 받고 있다. 관계 부처는 개발 단계부터 한국 출시가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유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개발한 신약의 혜택을 큰 국가만 받고 있다. 관계 부처는 개발 단계부터 한국 출시가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유감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해당 약물에 대해서는 국내 임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약물 도입에 대해서는 계획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치료제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방안들이 수립‧실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0년 뇌전증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 질환 인식개선 홍보, 사회복귀 프로그램, 뇌전증 환자 코호트 구축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뇌자도, ROSA 수술로봇과 같은 정밀 진단‧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약물 난치성 뇌전증 치료는 수술이나 신경자극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기본은 약물 치료다.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일부이며 모든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또한 뇌전증 질환은 특수성이 있어, 다른 질환과 달리 신약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더불어 의료진에게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뇌전증은 질환의 발병기전 자체가 복잡해서 환자마다 양상이 제각각이다. 질환의 특성상 head to head 연구, 즉 약제 간의 효과 우월성 비교 자체가 사실상 불가하다 보니, 신약 개발이 까다롭고 효과에 대한 인정도 인색하다”며 “최근 개발된 좋은 신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내 환자들이 보다 우수한 신약을 빠르고 저렴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각 기업들이 국내에서 임상 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주는 동시에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신약의 경우,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신약이 필요한 난치성 환자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하엘, 푸단대와 손잡고 주름 개선 신물질 ‘E... -
02 명인제약, 청약 증거금 17조 3,634억원…경쟁... -
03 차바이오텍 CGT 전초기지 '마티카바이오', ... -
04 SK케미칼, 2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 결... -
05 메디톡스, 콜산 성분 지방분해주사제 ‘뉴비... -
06 K-뷰티, 글로벌 확장 속 과제는 ‘변화 대응’ -
07 종근당, 국내 제약업계 최초 AI 기반 지능형... -
08 “CGT 혁신, 글로벌서 해법 찾다” 차바이오 '... -
09 티앤알바이오팹, ‘바이닥터엘리’와 미국 하... -
10 유한양행, 오송 신공장 기공… 글로벌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