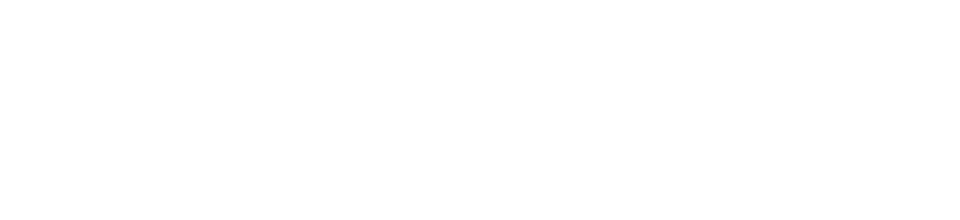뉴스
바이오 생태계 구축, ‘다양성’ 전제한 인력 키워야
오픈이노베이션으로 각 전문성을 인정 및 교류…데이터 중요성도 강조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입력 2019-12-16 17:51 수정 2019.12.17 07:18
신약개발을 위한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한 인력을 개발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열린 2019 바이오미래포럼에서는 각 국의 바이오생태계 현황이 발표됐다.

|
미국 켈리포니아 대학교 권영직 교수는 “흔히 개발 전략을 얘기할 때,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과 경쟁이 수월한 블루오션으로 비유한다. 개발을 성공하기 위해서 블루오션으로 시작해서 레드오션 때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바다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즉 생태계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가 핵심이다”고 말했다.
최근 괄목할 만한 치료제인 CAR-T, 세포, 면역억제제, 유전자, RNA억제제를 타깃으로 한 개발이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치료제들은 사실 예전부터 연구 돼왔으며 지금 와서야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권 교수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가장 많은 신약 개발 성과를 낼 수 있던 걸까.
권 교수는 “두 가지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미국은 다양한 민족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했다”며 “신약개발의 성공은 기술, 헬스케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적합한 인재가 있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연구는 어떤 기술을 선택하고 어떤 연구자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을 전제한 오픈이노베이션으로 각 분야에서의 인재 또는 그들을 포함한 기업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상업화를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다.
또한 연구는 다수의 연구자가 있을수록 다양한 연구를 시행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선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업화가 가능한 부분을 골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권 교수는 “제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업들 사이의 기술이전이 매우 활발하다. 이를 통해 서로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성과 후 분배를 통해 커갈 수 있다”며 “바이오라는 필드 안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캠브리지대학 밀너(Milner) 의약연구소 한남식 교수는 “캠브리지 대학은 정부 지원을 주도로 연구소, 병원,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다양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최근 5~6년 간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이를 통해 ‘다양성’을 전제로 큰 제약사부터 중소기업, 다국적 기업, 연구소, 대학병원이 어우러진 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연구가 논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환자에게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벤치 두 베드 시스템(bench to bed)이 가능하다는 것.
그 중심에 밀너(Milner) 연구소는 실질적인 드라이브를 이룰 수 있도록 산학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밀너 연구소는 7개의 다국적 제약사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80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움을 개최해 여러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 교수는 “거리나 분야에 크게 상관없이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함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한다”며 “이로써 빠르고 실현 가능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엔진의 역할을 연구소가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 안에서 주축이 되는 ‘데이터’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양성, 인프라, 협력 등 이들을 연결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라며 “정부의 지원보다 먼저 훌륭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내외를 이을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메디컬에이아이 '의료 AI' 국가전략기술 확인 -
02 "과학자 2700명 모였다" 한국분자·세포생물... -
03 GC녹십자 창립 58주년, ”도전 정신으로 미래... -
04 싸토리우스, 10월 '바이오 DSP 심포지엄' 개... -
05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첨단재생의료산... -
06 SK바이오사이언스, 영유아 RSV 예방 항체주... -
07 셀트리온, UEGW 2025서 ‘램시마SC’ 장기 임... -
08 알리코제약, '알듀카정' 앞세워 650억 고... -
09 SK바이오팜, 역대 최대 실적 기틀 마련 미국... -
10 프로티움사이언스, 누적 수주액 400억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