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퍼스트-인-클래스 개발, ‘검증’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물질에 대한 확신보다 가설·타겟에 대한 확신 높여야
전세미 기자 │ jeonsm@yakup.com


입력 2018-12-06 16:28 수정 2018.12.06 16:30
디스커버리(Discovery).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이행적(translational).
이 세 단어는 동아에스티 윤태영 연구본부장(Head of Research)이 5일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MFDS-DIA 공동 워크숍'에서 연자로 나서 '퍼스트-인-클래스 신약 디스커버리의 도전과제 : 연구에서 출발한 치료약물로의 이행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시로 언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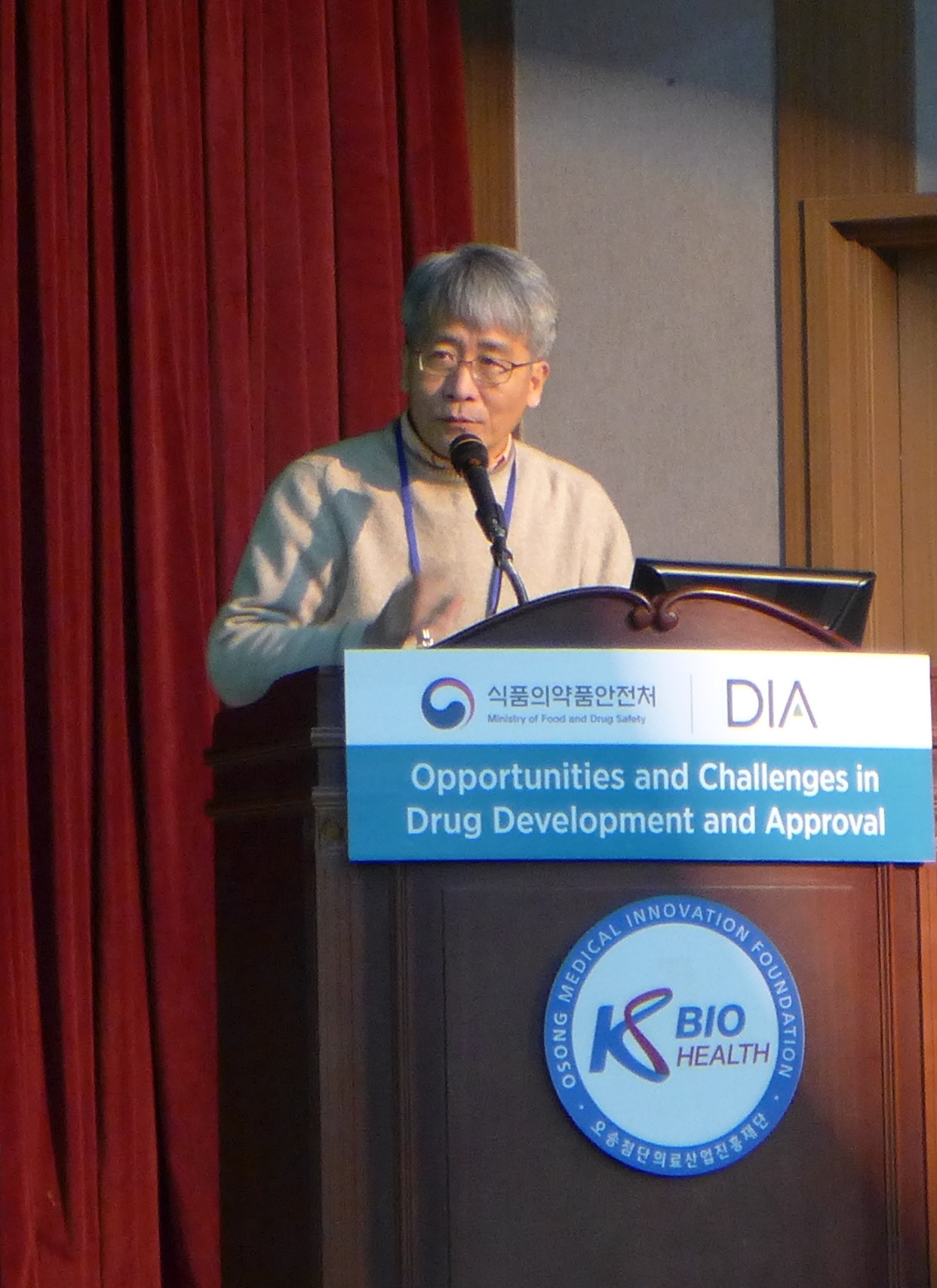
|
이어 “퍼스트-인-클래스 신약처럼 기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을 임상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스커버리’지만, 아쉽게도 한국에는 통용되는 표현이 없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디스커버리라는 여정은 곧 이행적(translational) 디스커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윤 본부장은 “이행은 곧 연구(science)가 치료약물(medicine)로 귀결되는 과정이며, 아직까지 연구의 영역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임상적 관찰, 즉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치료적 타깃(therapeutic target)’이라는 키워드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을 때, 1991~1995년 사이에는 146건의 결과가 나왔다면 20년이 지난 2011~2015년 사이에는 1만7420건,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3만건을 가볍게 돌파한 결과가 나왔다고 윤 본부장은 언급했다.
그만큼 퍼스트-인-클래스 신약을 찾기 위한 디스커버리는 유효(hit), 선도(lead), 후보(candidate)로 이어지는 물질 자체에 대한 확신을 높이는 접근보다는 가설과 타겟에 대한 확신을 높이는 검증(validation)이라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퍼스트-인-클래스 디스커버리 특징 몇 가지를 강조했다.
△가설을 기반으로 찾은 유효(hit)가 실제로 타깃에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 △세포 단위에서 생물학적 표현형(phenotype)을 보이는지에 대한 검증, △선도(lead) 물질을 도출해 in vivo 동물모델에서 재차 확인하는 검증, △후보(candidate) 물질을 갖고 인체에서 검증하는 임상시험처럼 전주기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검증 등이다.
이어 그는 “검증 증심의 퍼스트-인-클래스의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가설을 기반으로 찾은 물질에 대한 가치는 In vivo 단계의 개념증명(in vivo PoC)과 임상 단계의 개념증명(clinical PoC)에서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동아에스티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 상황에 비춰 보면 새로운 기전의 퍼스트-인-클래스 신약을 갖고 글로벌 임상을 풀스케일로 진행하는 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있다”며 “따라서 동아에스티는 in vivo 개념증명 단계에서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여러 물질들의 가치 상승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부광약품 자회사 콘테라파마, ‘CP-012’ 1b상... -
02 바이오솔루션, 흥케이병원과 연골재생치료 ‘... -
03 명인제약, 공모가 상단 58000원 확정…의무보... -
04 이엔셀, 세계 최대 세포유전자치료제 컨퍼런... -
05 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개막…"변... -
06 식약처·중기부, 화장품 수출 규제 대응 세미... -
07 HK이노엔 신약 케이캡, 인도 공식 출시…글로... -
08 “식약처 심사원도 사람입니다…정부 보험 지... -
09 셀트리온, 1000억원 규모 자사주 추가 매입 ... -
10 에이치이엠파마, 세계적 항노화 연구 성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