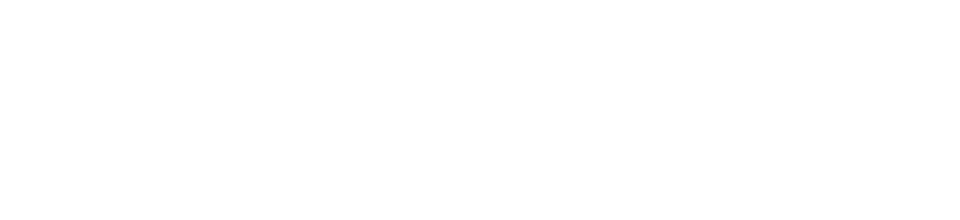뉴스
면역항암제 효과 높지만 ‘보장성 확대'는 아직 이르다?
국민-정부-환자-제약사 모두 이해 합당한 결과 도출해야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입력 2019-12-19 15:45 수정 2019.12.20 09:17
면역항암제의 등장은 다양한 암에서 환자들의 생존율 증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소수 암환자의 보장성 강화는 아직 더 고려해야 할 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환자의 효율적 치료 중심’을 주제로 환자, 정부, 의료진이 모여 이같이 논의했다.

|
박 교수는 “전체 환자에서 객관적 반응률(ORR)은 33%로 1년 정도 반응 기간을 유지했다. 생존율도 약 10.2개월로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환자의 50%정도가 독성을 보였지만 중증도 독성은 단 10%에게 나타나 표적치료제에 보다 월등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그 효과를 입증했으며 결과에서도 치료를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암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적으로 부담되는 질병으로 당장 비용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보장성을 강화해 다양한 환자에게 효과를 본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절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는 “면역억제제는 신장암에서도 큰 희망을 가져왔다. 다만 면역억제제도 결국 긴 항암치료들 중 하나일 뿐 이다"며 "경제성 평가가 실상 필요한지 의문이다. 환자의 경우 허가받은 약제를 다 쓸 수도 없을뿐더러 효과가 없다면 사용하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치료 전제가 맞는 약제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산정특례 5% 지원 말고 부담이 되더라도 다양한 약제 선택할 수 있는 필요하다. 맞춤 치료상태를 반영해야 한다”며 “치료 불확실성을 고려해 환자와 정부가 초기 부담을 함께하고 효과가 지속되면 안정적 투약을 위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는 “효과가 좋은 것과 별개로 결국은 돈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다. 국민이 항암 치료제 시장에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지, 어떤 의료진이 찬성하는 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장성 확대에 앞서 정부-의료진-제약사-환자-국민 모두의 의견에 합당한 결과를 내보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우선 정부는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중증질환, MRI 보험확대, 첩약까지 제한된 재정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한다. 또한 신약에 재정 비중을 두겠다면 기존 약의 투자를 줄이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한 제도를 바꾸려하기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의 다양화로 변화를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의료보험이 모든 걸 해주지 않는다. 국민, 환자도 나라에서 모든 걸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약사도 고가의 신약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약물의 약가를 낮춰 환자의 사용을 지속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보장성 강화, 재정 이 모든 키를 정부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제약사가 쥐고 있다. 소수 암에는 관심이 없으며 재정, 환자 보호에 대해서도 계획조차 없다. 정작 급여도 와서 되면 좋고 아니면 아닌 식이다. 협상 과정도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산정특례 한계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확대하고 사전 약가인하제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소수 암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비소세포폐암서 면역항암제, 급여 합당한 효과 보였나
2019-10-28 07:14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메디컬에이아이 '의료 AI' 국가전략기술 확인 -
02 "과학자 2700명 모였다" 한국분자·세포생물... -
03 GC녹십자 창립 58주년, ”도전 정신으로 미래... -
04 싸토리우스, 10월 '바이오 DSP 심포지엄' 개... -
05 K-바이오랩허브사업추진단, 첨단재생의료산... -
06 SK바이오사이언스, 영유아 RSV 예방 항체주... -
07 셀트리온, UEGW 2025서 ‘램시마SC’ 장기 임... -
08 알리코제약, '알듀카정' 앞세워 650억 고... -
09 SK바이오팜, 역대 최대 실적 기틀 마련 미국... -
10 프로티움사이언스, 누적 수주액 400억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