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의약품 도입·제네릭 동등성 국민 인식 향상·조건부 심사 단점 해결 등 지적


|
국내 신약에 좀 더 집중하고 제네릭 동등성 국민 인식도를 개선하는 등 국내 규제과학의 발전과 제약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규제당국과 학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는 1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바이오헬스혁신 가속화를 위한 규제과학혁신(Regulatory Science Innovation for Accelerating Bio-Health Innovation)’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임 처장을 역임한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규제과학혁신과 의약품 접근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의경 교수는 우리나라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요 이슈로 △의약품 도입 지연(Drug Lag)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 제한, 시장진입과 동등성 인식 △의약품 공급 부족(Shortage)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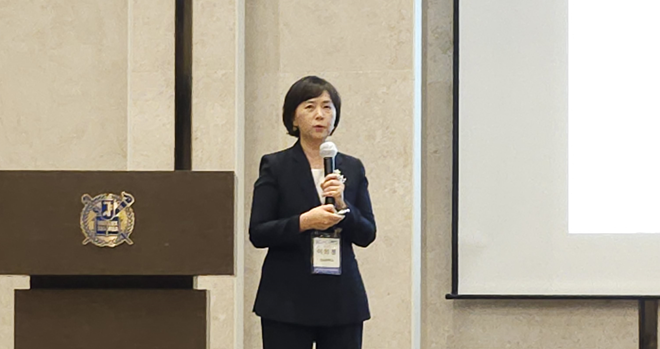
|
이 교수는 “2011년부터 20199년가지 미국, 유럽,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신약 365개 중 한국에서 환자가 쓸 수 있는 약은 35%에 불과한 128개”라며 “이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같은 의약 선진국인 A7 국가의 편균인 200개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암제의 경우에는 A7 국가의 평균이 69%인 것에 반해 한국은 45%에 불과하다”며 “Linchtenberg의 연구에서 2005년 이후 출시된 의약품의 국가별 판매 비율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신약 접근성은 조사된 31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규제당국은 △조건부 허가제도 △신속심사제도 △GIFT 등 신속심사 및 조건부 허가 제도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신속 심사, 신속 허가는 신약 심사 기간을 단축해 중증 환자의 치료제 조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신속 심사, 신속 허가는 △근거의 불확실성 증가 △3상 임상 이행 저조 △효과 입증 부족 등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하고 있다.
근거의 불확실성 증가는 결국 환자의 위험 노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급여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조건부 허가의 경우 국내 제약사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이 교수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조건부 허가된 35품목 중 정기보고를 제출한 품목은 20%인 7개 품목 밖에 되지 않는다”며 “35품목 중 국내 개발 신약은 10개에 불과한데, 이러한 가운데 조건부 허가를 받고 임상 미제출한 국내 개발 신약은 8개, 허가를 철회한 품목은 2개로 사실상 ‘0’”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신약의 경우 식약처가 최초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건부 허가를 통해 근거가 불투명하거나 허가 처리가 명확하게 끝맺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규제과학은 국산 신약을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인력 집중을 국내 개발 신약에 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개발 신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 동등성에 대한 국내 소비자 인식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 식약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품질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서 제네릭은 78.5%를 차지하고 약품비의 경우 53%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동등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는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생동성 시험을 하고, 동등성을 입증한 제네릭 의약품은 국민들이 동등하다고 인정하고 임상 현장에서도 인정해 처방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이 차이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FDA의 경우 제네릭 동등성에 대한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으면서 동등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식약처장 시절에 제네릭 동등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현재 식약처도 FDA와 마찬가지로 대체조제, 약가산정 등의 제도 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특허권이 소멸했지만 제네릭이 개발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을 규제당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2022년 10월 기준 등대 특허권이 소멸된 1004개 중 476품목은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특히 셀트리온제약의 복합제 ‘고덱스’를 꼬집었다. 고덱스의 연간 생상실적은 737억원에 달하고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후발의약품이 미출시 되면서 53.55%의 약가인하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고덱스와 같은 콤플렉스 제네릭은 개발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FDA의 경우 컴플렉스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위해 자체 연구센터를 만들어 정부, 학계, 제약사 간 소통과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콤플렉스 제네릭을 개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등재특허권이 소멸된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인하되면서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과학 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규제과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우리나라 차원에서 세팅해야 하는 등 주력 분야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당국과 학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01 폐플라스틱,진통제 타이레놀 주성분 '아세트... -
02 미샤, 일본서 ‘글로우’ 시리즈 출시… 매직쿠... -
03 씨앤씨인터내셔널, 중국서 '승승장구'…최대... -
04 셀트리온홀딩스,1조 재원 확보..지주사 사업... -
05 신테카바이오,‘10대 타깃 중심’ 전략 전환..... -
06 강스템바이오텍,'피부 오가노이드 아토피 모... -
07 티앤알바이오팹,이연제약 공동개발 ‘매트릭... -
08 메디포스트, 카티스템과 고위 경골 절골술 ... -
09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 ‘웰리렉’, 급여 적... -
10 “이번 기회 놓치면, 한국 바이오 끝장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