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내외 ‘장기칩’ 연구 속속, 어디까지 가능할까
눈, 피부, 심장, 신장 등 15종 이상…신약개발 효율화 기대
박선혜 기자 │ loveloveslee@yakup.com


입력 2019-08-07 06:00 수정 2019.08.07 0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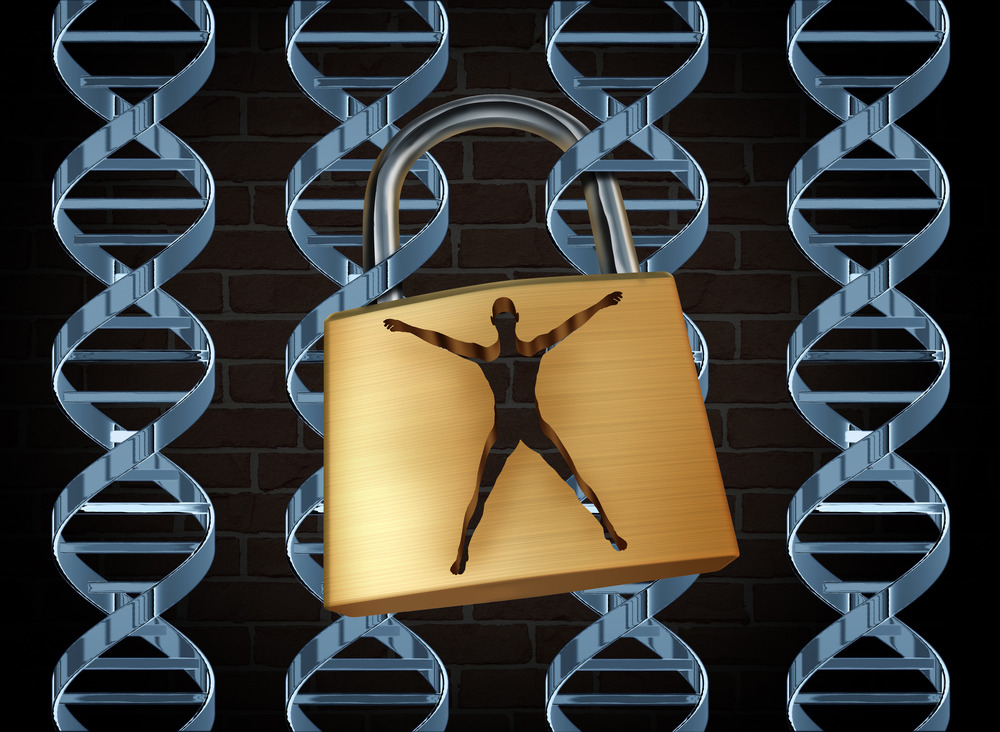
|
‘장기칩(organ on a chip)’은 동물시험 대체와 더불어 신약개발에 있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히 이뤄져왔다.
최근 국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따라 조직칩 개발을 포함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장기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피부, 심장, 신장, 장, 태반 등 15가지가 넘는 장기칩이 개발된 가운데, 어떤 연구들이 주목돼왔을까.
가장 최근 5일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바이오공학과 허동은 교수의 연구에서는 안구 표면을 형성하는 각막과 결막, 이 위를 덮은 눈물층까지 재현한 '블링킹 아이온어칩'(blinking Eye-on-a-chip)을 개발했다. 눈 깜빡임 횟수를 조절해 안구건조증 상태와 비슷하게 만든 뒤, 안구건조증 신약 후보 물질을 넣어 약효를 검증해냈다.
또한 허 교수는 이전에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사람의 폐를 모사한 '렁온어칩'(Lung-on-a-chip)을 개발해 이 기술을 기반으로 흡연의 영향과 천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최태현 교수팀은 세계 최초 ‘피부 모델’(skin on a chip)을 개발했다. 최 교수팀이 개발한 피부모델 마이크로칩은 1cm정도의 실리콘 위에 인체 세포를 키워 만든 인공 장기이다. 알레르기, 염증 및 약물전달 등의 추가시험이 가능하다.
서울대병원 전누리 교수는 ‘큐리오칩스’이라는 벤처기업을 창업해 ‘혈관칩’을 개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혈관칩은 인체의 혈관과 특정, 장기조직을 체외 모사해 혈관을 통한 약물 반응을 평가할 수 있고 각 환자의 실제 조직의 일부를 활용해 개인맞춤형 의료기술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장기칩을 이용한 연구들이 있다.
미국의학과학논문소개지 유레칼러트에 실린 미국 브리검 여성 병원(BWH) 연구팀의 ‘구글 글래스(Google Glass)'는 디지털헬스케어와 장기칩을 접목한 생체 시스템이다. 본 연구팀은 구글 글래스의 원격 제어시스템을 활용해 간 유사기관에 화학의약품을 주입한 결과 인체의 생리적 반응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을 확인했다.
면역시스템을 모사한 칩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도준상 교수 ‘면역시스템 모사 칩 연구’ 논설에 따르면 Halaas 연구진은 필터가 내장된 microchannel을 이용해 농도 구배가 형성될 수 있는 면역칩을 제작했다. 이는 넣어주는 물질에 따라 다양한 감염성 질환 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암 등에 대한 면역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Wiklund 연구진은 microwell과 정재초음파(ultrasonic standing wave)를 이용해 3D 형태의 고형암과 NK 세포를 반응시킬 수 있는 면역칩을 만들어냈다. NK 세포가 3D 암조직을 인식하고 죽이는 면역반응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연구진은 고형암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NK 세포와 암세포의 비율이 1:10정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홍익대학교 성종환 교수는 ‘보건의료산업에 활용 가능한 장기칩 기술 동향’ 논설에서 “장기칩은 신약개발과정에 있어서 동물시험을 줄일 수 있고, 직접적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스크리닝이 가능하며 독성평가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장기모듈별로 칩을 구현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의료현장이나 제약산업, 생명공학 연구현장에서의 수요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용자 편리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대한약사회 “정부는 한약사 문제 즉시 해결... -
02 바이오솔루션,연골세포치료제 '카티로이드' ... -
03 동아쏘시오홀딩스, 바이오시밀러 상반기 매... -
04 유한클로락스,창립 50주년 새 기업 로고 공개 -
05 GC녹십자,텍사스주 혈장센터 개소..내년 상... -
06 HLB, HLB사이언스 흡수합병... 패혈증 신약 ... -
07 부광약품 자회사 콘테라파마, ‘CP-012’ 1b상... -
08 바이오솔루션, 흥케이병원과 연골재생치료 ‘... -
09 명인제약, 공모가 상단 58000원 확정…의무보... -
10 이엔셀, 세계 최대 세포유전자치료제 컨퍼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