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글로벌 출시 유전자치료제 7개, 문제는 ‘비싼 약가’
억대 약가 탓에 수익성 및 상업화 불투명 사례 존재
전세미 기자 │ jeonsm@yakup.com


입력 2018-11-28 06:00 수정 2018.11.28 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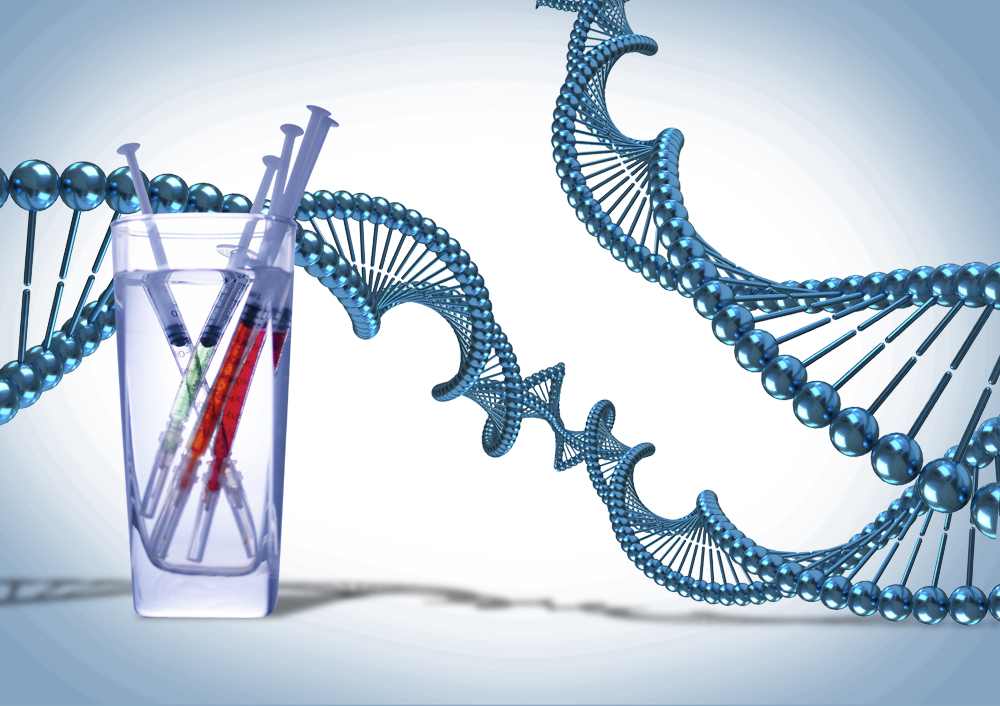
|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코디네이팅센터는 최근 ‘2018 첨단바이오의약품 최신동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유전자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시장에 출시된 유전자치료제는 총 7개로, 사실상 임상적으로 성공한 유전자치료제라 하더라도 치료비용이 매우 고가인 탓에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제일 먼저 2012년 생명공학기업 유니큐어(UniQure)가 지질분해효소결핍증(Lipoprotein lipase deficiency, LPLD) 치료제 글리베라(Glybera)를 유럽시장에 출시했다.
그러나 이후 글리베라는 고가의 치료 비용(110만 유로, 한화 약 15.2억원)과 더불어 희귀질환 치료제라는 점에서 수요 부족으로 미국에서의 승인 신청을 포기하고, 유럽에서도 2017년 재승인을 포기한 채 시장에서 철수됐다.
2015년에는 암젠이 임리직(Imlygic)을 미국시장에 출시했다. 임리직은 온콜리틱 바이러스(Oncolytic Virus)를 이용한 악성흑색종(Melanoma) 환자의 피부와 림프절 병변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평균 치료비용은 약 6만5천달러(한화 7천3백만원)였다.
2016년 영국의 제약회사 GSK사는 스트림벨리스(Strimvelis)를 유럽시장에 출시했다. 스트림벨리스는 희귀질환인 아데노신 디아미나아제 결핍증(ADA-SCID)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치료제로, 이 역시 고가였다(65만달러, 한화 7.8억원). 따라서 수익성 뿐 아니라 상업화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17년 3건의 유전자치료제를 승인한 바 있다. 2개는 항암 능력을 높인 CAR-T 세포유전자치료제(ex vivo)였으며, 1개는 희귀 유전성 망막질환에 대한 유전자치료제(in vivo)였다.
최초의 CAR-T 세포 유전자치료제는 2017년 8월 승인된 노바티스의 킴리아(Kymriah)다. 뒤이어 길리어드/카이트 파마의 예스카타(Yescarta)가 2017년 10월 승인됐지만, 약가가 약 5억원에 달해 부대비용까지 더할 경우 약값은 2배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2017년 12월에는 스파크 테라퓨틱스가 럭스터나(Luxturna)를 미국시장에 출시했다. 현재 유럽에도 승인 신청을 한 상태지만, 이 역시 1회 처방 비용이 무려 약 9억4천만원(85만달러)으로 부대비용까지 더할 경우 약값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다행히도 최근에 비교적 상업화에 가까워진 안티센스 치료제(Antisene drug) 사례가 나타났다. 2016년 12월 허가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Spinraza)가 그 주인공이다.
스핀라자는 첫 해 6회 투여 치료 비용이 8억 4천만원(75만달러)에 달했다. 그 다음해 3회 투여로 투여횟수가 줄어들어 치료 비용이 4억 2천만원(37만5천달러)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이 역시 고가였다.
그러나 2017년 2분기 분기 매출액 집계 결과 2천억원(2억달러)을 돌파하면서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유전자치료제는 한 번의 치료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전세계적으로 계속해 개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허가가 임박한 주요 유전자치료제로는 블루버드 바이오의 소아기 대뇌 부신 백질 영양장애 치료제인 렌타-D, 지오팜 온콜로지의 유방암·흑색종 치료제인 Ad-RTS-hIL-12, GSK의 비스코트-올드리지증후군 치료제인 GSK2696275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임상 2상 또는 3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
01 대한약사회 “정부는 한약사 문제 즉시 해결... -
02 바이오솔루션,연골세포치료제 '카티로이드' ... -
03 동아쏘시오홀딩스, 바이오시밀러 상반기 매... -
04 유한클로락스,창립 50주년 새 기업 로고 공개 -
05 GC녹십자,텍사스주 혈장센터 개소..내년 상... -
06 HLB, HLB사이언스 흡수합병... 패혈증 신약 ... -
07 부광약품 자회사 콘테라파마, ‘CP-012’ 1b상... -
08 바이오솔루션, 흥케이병원과 연골재생치료 ‘... -
09 명인제약, 공모가 상단 58000원 확정…의무보... -
10 이엔셀, 세계 최대 세포유전자치료제 컨퍼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