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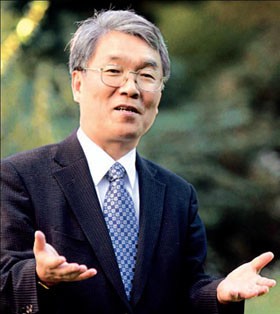
환자가 어떤 약물의 제제(製劑)를 먹으면, 위장관 내에서 약물이 제제로부터 방출 (放出, release)된 후 흡수, 분포, 대사, 배설(ADME)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약효가 나타났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의 발전에 따라 이 과정이 적지 않은 인자들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예컨대 정제(錠劑, tablets)로부터 약물이 방출되어 나오는 속도는 정제를 제조하기 위해 첨가한 첨가제의 종류와 구성 비율, 그리고 제조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 방출된 약물이 인체에서 흡수된 후 대사 과정을 이겨내고 약효의 발현 부위인 병소(病巢)에 까지 도달(분포)하는 과정에는 약물 분자의 크기, 하전(荷電) 및 지용성(脂溶性) 같은 약물 측의 성질뿐만 아니라, 위장관 운동, 약물의 각종 세포막 투과 속도, 혈류, 혈장 단백과 약물 간의 결합, 소장 및 간에 존재하는 효소 들에 의한 약물의 대사, 약물의 조직결합, 타겟 부위 세포 표면 수용체(受容體, receptor)와 약물 간의 결합 같은 생체 측 인자들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약물의 체외 배설과정도 마찬가지이다.
한번 소장에서 약물이 흡수되는 과정을 살펴 보자. 소장 상피세포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 등을 적극적으로 흡인하는 막수송체(단백질)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운 물질은 흡수되지 않도록 세포 밖으로 퍼내는 배출 펌프(단백질)도 다양하게 발현되어 있다.
이 단백질들은 입을 통해 위장관에 도달한 각종 영양물질이나 약물 분자를 선택적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물질이면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물질이면 적극적으로 흡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약물의 대사와 분포, 그리고 배설도 약물을 분자 수준(분자량, 하전, 구조 등의 특성)에서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각종 단백질의 작용에 의해 콘트롤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약물의 ADME를 분자적 수준에서 이해하지 않고서는 약제학의 목표인 ‘바람직한 약물 송달’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21세기가 되면서 약제학의 영역에 분자적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이는 때마침 발달한 분자생물학(分子生物學, molecular biology)에 힘입은 바 크다. 약제학에 분자적 또는 분자생물학적 개념을 도입한 학문을 ‘분자약제학(分子藥劑學)’이라고 부른다.
이제 약제학은 생물약제학 또는 약물동태학이라는 옷에 이어 분자약제학이라는 최신 유행의 새 옷을 입게 되었다. 최근 발간된 ‘Molecular Pharmaceutics’라는 국제 잡지의 impact factor 값은 2009년도에 5.4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는 오늘날 분자약제학이 얼마나 유행인가를 한마디로 보여 준다. 이미 일본 약대의 ‘약제학 교실’은 대부분 시류(時流)를 좇아 ‘약제학’이라는 전통적인 이름을 버리고 ‘분자약제학 교실’ 과 같은 세련된 (?) 이름으로 창씨개명(創氏改名)하였다. 머지 않아 ‘약제학’은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는 일제(日帝)의 잔재(殘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마 현재 약대에서 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학부나 대학원 시절에 배우지 않은 내용을 연구하거나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한다.
나만해도 현재 막수송(膜輸送)을 주요 연구 과제로 삼고 있지만, 이는 나의 학부 시절은 물론 80년대 초 동경대학에 유학할 때에도 배워보지 못했던 개념이다.
그래서 약제학자들은 유난히 고생이 많았다. 그러나 이처럼 과학의 발전을 끊임없이 담아내고 변신을 거듭한 덕분에 오늘날까지 약제학이 약학 내에 확실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몇몇 약대 교과목들이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고 변신을 거부한 결과, 오늘날 많은 학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일이다. 그렇다. 약제학을 살린 것은 변화이었다. 조제학에서 시작된 약제학은 이제 ‘분자약제학’으로 진화, 변화하여 꽃 피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