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5> 닻꽃(Halenia corniculata)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한국사진작가회회원 권 순 경 기자 │ news@yakup.co.kr


입력 수정 최종수정 2018-11-14 0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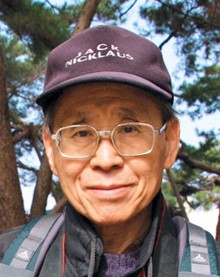 ▲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한국사진작가회회원 권 순 경
▲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한국사진작가회회원 권 순 경여름에서 가을 계절로 바뀔 즈음 가장 먼저 피어나는 야생화 중에 닻꽃이 있다. 가을의 전령사인 셈이다. 닻꽃은 그 모양새가 주변의 보통 꽃들과는 다른 독특한 모양으로 닻꽃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면 저런 기기묘묘한 꽃도 있구나 하고 저절로 감탄사를 자아내게 된다.
닻꽃은 경기도 이북의 높은 산 양지바른 풀밭에 자생하는 북방계 식물로서 자생지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남쪽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개체 수가 많지 않아 만나기가 쉽지 않은 희귀식물에 속한다. 그래서 멸종위기의 야생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화악산에 비교적 많이 자생하고 있고 백두산의 2천 미터 고지의 바위틈에도 자라고 있을 정도로 추위에 강하다. 닻꽃은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식물로 용담과에 속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줄기는 물론 뿌리까지 모두 고사해 버린다. 종자로만 번식이 가능하다.
줄기는 가늘고 네모지며 10~60센티미터 정도 높이로 자라고 가지가 여러 개로 갈라진다. 고산식물이지만 털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잎은 마주나며 잎자루가 없고 긴 타원형 내지 좁은 달걀 모양을 하고 있으며 3개의 잎맥이 뚜렷하다.
 |
8월에 줄기 끝이나 잎겨드랑이에서 연한 황록색 꽃이 한 송이 또는 여러 송이가 핀다. 꽃자루가 있으며 꽃받침과 꽃잎(화관)이 각각 4개이며 꽃받침은 완전히 갈라져서 가느다란 형태로 끝이 뾰족하며 녹색이다.
네 갈래로 갈라진 꽃잎은 각각 갈라진 잎 조각의 아래쪽으로 가늘고 기다란 돌출부가 위로 휘어져 있으며 이를 전문용어로 거(距)라 하고 며느리발톱, 또는 꽃뿔이라도 부른다.
꽃뿔은 꽃받침이나 꽃잎의 변형으로 생겨나며 속이 비어 있거나 꿀이 들어 있다. 꽃뿔은 달팽이 뿔을 닮기도 했지만, 사방으로 휘어져 뻗은 4개 꽃뿔의 전체모습은 닻을 닮았다.
꽃뿔을 가진 식물이 여럿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물봉선, 삼지구엽초, 매발톱꽃 등이다. 특히 봄철에 닻꽃처럼 닻 모양의 꽃을 피우는 삼지구엽초를 ‘닻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닻꽃과 혼동하기 쉽다. 수술은 4개이고 암술은 1개이며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꽃잎 안에 들어있다.
닻꽃을 닻꽃풀 또는 닻꽃용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닻꽃 이름은 꽃의 모양에서 비롯되었다. 배가 정박할 때 배를 고정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이는 것을 닻이라 하는데 꽃 모양이 바로 이 닻을 닮았기 때문이다. 일본 이름은 하나이까리(ハナイカリ)이며 역시 닻꽃이라는 뜻이다.
닻꽃은 일본 이름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다. 학명의 속명 할레니아(Halenia)는 린네(Linne)의 제자인 스웨덴 사람 야나스 페트리 할레니우스(Janas Petri Halenius)의 이름에서 비롯되었고 종명 코르니쿨라타(corniculata)는 ‘뿔’의 뜻인 라틴어 코르니쿨라투스(corniculatus)에서 비롯되었으며 꽃의 돌출부인 꽃뿔의 모양이 뿔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린네는 스웨덴 사람으로서 식물의 이명법(二名法)을 창안하여 도입한 사람이다. 이명법은 속명(屬名)과 종명(種名) 그리고 최초의 발견자 이름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모든 학자가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면 이명법의 작명원칙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라틴명으로 이름을 지어서 발표한다. 작명하여 발표된 라틴어 식물명은 변경할 수 없다.
한방에서는 식물 전체를 채취하여 건조한 것을 화묘(花錨)라 하고 열을 내리거나 해독 또는 피를 맑게 하고 출혈을 멎게 하는 데 사용했고 간염 치료에도 사용했다. 밝혀진 성분으로 키산톤(xanthone) 배당체 및 플라보노이드(flavonoid) 배당체가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행정·제도]
우리나라 항생제 소비량, 그리스‧터키 이어 OECD 3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