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3> 석잠풀(Stachys riederi)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한국사진작가협회회원) 권 순 경 기자 │ news@yakup.co.kr


입력 수정 최종수정 2017-12-27 0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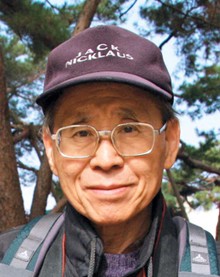 ▲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한국사진작가협회회원) 권 순 경
▲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한국사진작가협회회원) 권 순 경최근 이 석잠풀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치매예방과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갑자기 유명세를 타게 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석잠풀은 전국 각지의 들판이나 논두렁 또는 풀밭에 자라며 습기 있는 곳을 좋아하는 여러해살이식물로서 꿀풀과에 속한다.
줄기는 네모지고 30~80 센티미터 정도 높이로 곧게 자라며 가지를 치지 않는다. 줄기에 2개의 잎이 서로 마주나며 잎의 모양은 길쭉한 타원형 꼴로 잎자루가 있으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끝이 뾰족하다.
하얀 지하경이 옆으로 길게 뻗어있고 끝에는 누에고치처럼 생긴 괴근(塊根)이 여러 개가 달린다. 여름에서 초가을에 이르는 시기인 6~9월에 줄기 윗부분의 잎겨드랑이에 자그마한 연한 자주색 꽃들이 돌려가며 층층으로 핀다.
꽃은 입술모양이어서 위아래로 벌어져 있으며 윗입술꽃잎은 원형이고 아랫입술꽃잎은 3갈래로 갈라지고 짙은 흑색 반점이 있으며 밑으로 처져있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고 끝이 가시처럼 뾰족하다. 수술은 4개로 2개는 길고 2개는 짧으며(2강웅예) 암술은 1개이다.
 |
전 세계에 300여종의 석잠풀속 식물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우단석잠풀, 개석잠풀, 털석잠풀과 더불어 4종의 변종이 있다. 식물전체에 털이 있으면 털석잠풀이라 한다. 다른 꿀풀과 식물과 마찬가지로 향기가 있고 꿀이 많아 양봉에 중요한 밀원식물이다.
석잠풀의 지상부를 초석잠(草石蠶), 또는 광엽수소(廣葉水蘇)라 하며 꽃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약재로 사용되었고 어린 싹은 나물로 먹을 수 있다.
초석잠은 감기, 두통, 기관지염, 폐병에 사용되었고 지혈작용이 있어 토혈, 월경과다에도 사용되었다. 알려진 성분으로는 페닐아세테이트(phenylacetate), 콜린(choline), 스타키드린(stachydrine)이 있다.
석잠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으며 그 중에서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것을 소개하면 한자어로 석잠(石蠶)은 ‘돌누에’라는 뜻이다. 석잠은 물에 사는 곤충의 이름이며 ’물여우’라고도 하고 곤충의 어린벌레가 누에고치 모양의 원통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산다고 한다.
그래서 석잠이라고 불렀다. 석잠을 민간에서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누게 하는 이뇨제로 사용했다. 석잠풀의 땅 속 줄기의 덩이뿌리가 단단하고 누에나 번데기 모양을 닮았고 석잠과 마찬 가지로 감기 등 열을 내리는데 사용되므로 식물성 석잠이라는 뜻에서 ‘풀’을 첨가하여 석잠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한방에서 사용하는 초석잠(草石蠶)의 한글명이 석잠풀이다. 석참풀과 초석잠이 동일종이 아닌 각각 다른 식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본초강목에 석잠풀의 지상부를 초석잠이라 했으며 열을 내리거나 지혈제로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석잠풀의 덩이뿌리에 치매와 관련된 치료 및 예방효과가 있다고 일본 연구진이 처음 발표했다.
덩이뿌리를 달인 액을 쥐에 먹인 결과 뇌세포가 활성화 되고 다른 쥐에 비해 3배나 오래 살았다고 하며 이를 근거로 기억력 향상 및 노인성 치매 치료 예방 가능성을 추정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석잠풀의 알뿌리가 치매에 효력이 있다는 주장은 아직 초보적 단계인 것으로 생각된다.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치매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 하는 당사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과신은 금물이다.
석잠풀은 독성이 없음으로 덩이뿌리로 장아찌를 담가서 반찬으로 먹을 수 있으며 잎은 녹즙이나 차로도 마실 수 있다. 농촌에서는 새로운 특용작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지금 현재 유명약초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행정·제도]
우리나라 항생제 소비량, 그리스‧터키 이어 OECD 3위









